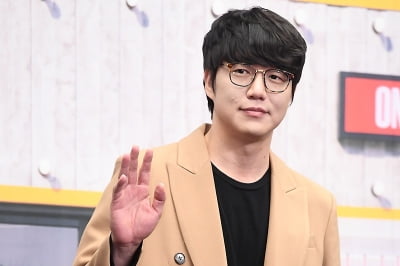[상권 大해부-3부 지역상권] (13) 원주 중앙동‥재래시장ㆍ패션매장 '절묘한 조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동 상권은 인구 30만명의 강원도 원주시 구도심을 대표한다.
단관·단계 택지 개발지구에 신흥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쇼핑을 할 만한 상점가는 중앙동이 유일하다.
이 상권을 관통하는 원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도로변의 패션 매장과 이면의 중앙시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상권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원주 지역에 아직 세워지지 않아 전국적인 의류경기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1970년대 생겨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의 틀이 완성됐고 90년대에 들어서 자유쇼핑센터 등 밀집상가가 중앙시장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다.
군 부대와 대학,의료기 관련 기업들이 많은 원주는 외지인 거주자가 많은 편이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거리여서 중소도시치고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꽤 눈에 많이 띈다.
업종별로 나누면 중저가 의류와 패션 잡화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으나 그외 업종은 2∼3년 전보다 매출이 20%가량 떨어진 업소가 대부분이다.
원일로 중심부의 중앙시장 입구를 축으로 양쪽 100m가 이 상권의 노른자 상권이다.
30평짜리 매장을 확보하려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 모두 5억∼6억원의 투자비용이 든다.
서울 강남역 수준인 월세 800만원짜리 매장이 있을 정도다.
중소도시치고는 보통 비싼 게 아니다.
인근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대로변 점포 시세가 워낙 비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건물주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대로변에 위치한 캐주얼 전문점인 '마루'는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이 온다.
30평 규모의 이 매장은 하루 평균 15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티셔츠 한 벌에 4만원,바지 5만원 정도로 중가 가격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최윤아 마루 원주점 매니저는 "평일엔 대학생들이 들르고 주말엔 동네 아줌마들이 와 옷을 산다"며 "너무 싸지도,비싸지도 않은 게 중앙동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중앙시장 이면도로에는 간혹 폴로,티니 등 서울의 유명 상권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 매장도 문을 열고 있다.
대로변에 입점하지 못한 업체들이 유동인구에 매료돼 시장 이면도로에 자리 잡은 경우다.
청바지 전문 매장의 한 관계자는 "여기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뒤떨어지면 곧바로 경쟁에서 탈락한다"며 "단골손님을 확보하지 못해 1년 만에 문을 닫는 집도 많다"고 말했다.
잡화를 취급하고 있는 '에이더스'는 주로 주말이 피크다.
학생 손님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박일복 에이더스 대표는 "1000원에서 1만원대의 상품을 팔고 있는데 대학생과 고등학생 손님이 대부분"이라며 "서울과 가까워 매주 한번씩 서울의 동대문과 남대문을 돌며 제품을 사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장은 50평 규모로 하루 평균 60만∼7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워낙 서울과 가까워 최근 뜨는 패션에 둔감하면 손님들이 안 온다"고 귀띔했다.
외식업체는 의류점에 비해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허영수 '토피돈까스' 사장은 "매장이 130평인데 주말에도 매장이 꽉 차지 않는다"며 "단관 지구에 음식점이 대거 생기면서 외식 인구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게의 객단가는 4000∼5000원이며 하루 평균 매출은 60만원 정도.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나온다.
재래시장을 찾는 30~50대 주부들은 간단한 요기를 위해 근처 분식점이나 떡 가게를 찾고 있어 매출이 짭짤한 편이다.
분식점 '엄마야'의 하영표 사장은 "객단가는 낮지만 시장에서 쇼핑한 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들르는 아줌마들이 많다"며 "덕분에 하루 평균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올린다"고 말했다.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원주중앙시장 번영회 사무국장 권태선씨는 "지하 6층,지상 2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매장을 구분할 계획"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은 손님이 많은 편이지만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 이 같은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