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 변호사 3인이 말한다 ‥ '느림보 의료소송' 처방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 A씨.그는 몇 년 전 병원의 오진으로 투여하지 말아야 할 약을 처방받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얼굴과 온몸이 마치 전신 1도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흉하게 변했다.
그는 일을 하지 못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위자료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벌인 결과 지난 4월 마침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 소요된 2년과 항소심 1년을 보태 총 3년간이나 법정 소송을 진행한 결과였다.
그래도 A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1심만 2∼3년씩 걸리는 의료소송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느림보 소송에 공정성 불신까지
각종 의료 시술이 보편화되고 환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에 연간 519건이던 의료소송은 2001년 666건,2003년 755건,2005년 867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그러나 마냥 늘어지는 소송기간에 공정성마저 불신받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재판부가 진료기록 판독이나 감정을 대학병원등 외부 의료진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감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감정료도 건당 30만원 안팎에 그쳐 병원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병원의 의사는 "진료 업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많은 법정 자료를 검토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감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크다.
한 변호사는 "의사들끼리 동질의식이 강해 웬만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며 "'초록은 동색'이라고 눈에 띄게 편파적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병원 측의 이 같은 행태를 그냥 넘어간다는 점이다.
재판부에 따라 입증책임이 환자 측과 의료진 사이를 오락가락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립 감정기구 설치 등 대안 마련 시급
치과의사 출신 1호 변호사인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는 "객관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입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감정기구를 설치해야 객관성을 담보하고 소송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의료진이 감정만을 위해 상주할 경우 인건비가 비싼 데다 내과 외과 등 과별로 의사들을 구성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것.희귀 난치질환이 전문인 서상수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의사협회 내에 민간 감정기구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조정 및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의료진 숫자 등에서 우리와는 전혀 실정이 달라 벤치마킹이 쉽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신체감정과 관련해서만 대법원 내규가 있는데 여타 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진료기록 감정 절차에 관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과전문의 출신 1호 변호사인 이동필 변호사는 진료기록 조작 내지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조작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간혹 진료기록을 깨끗이 정리해 다시 썼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첨단산업 지식재산권 환경 의료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판사들이 해당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심리위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심리기간도 단축되고 화해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얼굴과 온몸이 마치 전신 1도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흉하게 변했다.
그는 일을 하지 못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위자료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벌인 결과 지난 4월 마침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 소요된 2년과 항소심 1년을 보태 총 3년간이나 법정 소송을 진행한 결과였다.
그래도 A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1심만 2∼3년씩 걸리는 의료소송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느림보 소송에 공정성 불신까지
각종 의료 시술이 보편화되고 환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에 연간 519건이던 의료소송은 2001년 666건,2003년 755건,2005년 867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그러나 마냥 늘어지는 소송기간에 공정성마저 불신받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재판부가 진료기록 판독이나 감정을 대학병원등 외부 의료진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감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감정료도 건당 30만원 안팎에 그쳐 병원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병원의 의사는 "진료 업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많은 법정 자료를 검토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감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크다.
한 변호사는 "의사들끼리 동질의식이 강해 웬만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며 "'초록은 동색'이라고 눈에 띄게 편파적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병원 측의 이 같은 행태를 그냥 넘어간다는 점이다.
재판부에 따라 입증책임이 환자 측과 의료진 사이를 오락가락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립 감정기구 설치 등 대안 마련 시급
치과의사 출신 1호 변호사인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는 "객관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입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감정기구를 설치해야 객관성을 담보하고 소송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의료진이 감정만을 위해 상주할 경우 인건비가 비싼 데다 내과 외과 등 과별로 의사들을 구성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것.희귀 난치질환이 전문인 서상수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의사협회 내에 민간 감정기구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조정 및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의료진 숫자 등에서 우리와는 전혀 실정이 달라 벤치마킹이 쉽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신체감정과 관련해서만 대법원 내규가 있는데 여타 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진료기록 감정 절차에 관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과전문의 출신 1호 변호사인 이동필 변호사는 진료기록 조작 내지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조작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간혹 진료기록을 깨끗이 정리해 다시 썼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첨단산업 지식재산권 환경 의료 등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판사들이 해당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심리위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심리기간도 단축되고 화해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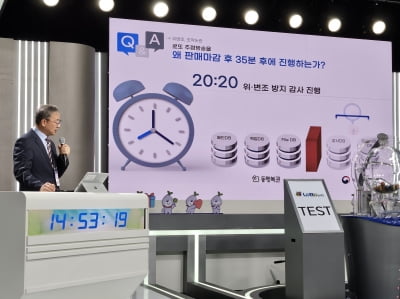
!["로또 조작 못하겠네"…추첨기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32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