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때 6개월만에 -60% … PBR 감안땐 850까지 내릴수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거 급락때와 비교하면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외환위기 때를 떠올리는 투자자들이 많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증시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기억 때문이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월 중순 코스피지수는 연중 고점(799.54)을 찍은 뒤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데 따른 위기감으로 주저앉기 시작했다.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지원 절차가 시작된 12월 중순(338.94)까지 6개월 동안 주가는 무려 57.6% 떨어졌다. 반년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나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다.
증시는 IMF 지원에 대한 기대로 반등에 나서 이듬해 3월 초 591.70으로 74.5% 상승했다. 3개월 정도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자 안도감이 확산됐지만 반등은 계속되지 못했다. 증시는 IMF가 내린 처방이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와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6월 중순까지 3개월여 동안 53.1% 빠졌다.
이후 증시는 4개월 이상 횡보세를 보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바닥을 다져 10월부터 상승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외환위기 땐 증시가 1차 충격을 받고 반등을 보인 뒤 2차 충격을 겪는 양상이라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었지만,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급락장에선 1차 충격과 2차 충격이 중간에 잠깐의 반등 국면도 없이 이어져 강도가 훨씬 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지수 1300선이 깨질 때 짧더라도 반등을 예상하는 분석이 많았는데 증시는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눌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증권은 외환위기 당시 국내 증시의 PBR(주가순자산비율)가 0.75배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를 현재 증시에 적용할 경우 코스피지수 850∼900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지수가 85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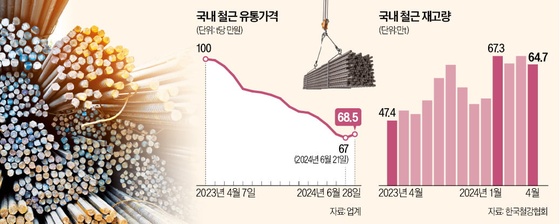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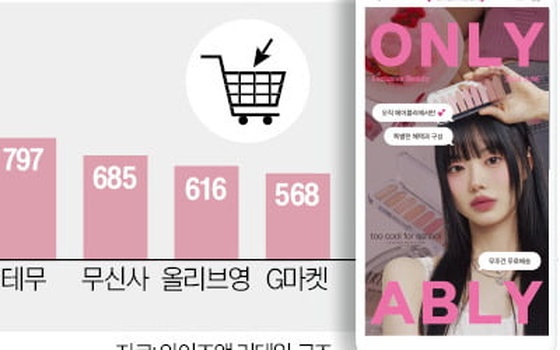
!["공연할 곳 없다" 아우성인데…희망고문으로 끝난 CJ라이브시티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1.357192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