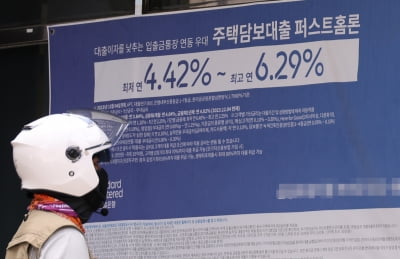[뉴스 인사이드] 전기차 시내주행 허용됐지만…보험문제 해결돼야 '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달 전기료 1만원 솔깃한데…
운행 구역 아직 지정 못해
실제주행은 하반기에나 될 듯
경차보다 400만~1000만원 비싸
보조금 지급·稅 감면 시행 논란
1회 충전에 100㎞ 주행 가능
충전기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운행 구역 아직 지정 못해
실제주행은 하반기에나 될 듯
경차보다 400만~1000만원 비싸
보조금 지급·稅 감면 시행 논란
1회 충전에 100㎞ 주행 가능
충전기 등 인프라 확충 시급
모터쇼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기차를 이달 말부터 도로 위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시속 60㎞로 속도가 제한됐긴 하지만,오는 30일부터는 전기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도로운행이 허용된다. 서울 시내만 따지면 시속 60㎞ 이하 도로가 전체 도로의 96.8%에 달해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만 아니면 웬만한 곳은 전기의 힘만으로 다닐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규정상으로 그럴 뿐,실제 전기차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전소 등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인프라도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 정부보조금도 책정되지 않아 값이 경차보다 비싼 점도 걸림돌이다.
◆도심에 선보일 전기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다만 최고 시속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기차 전문생산업체인 CT&T는 2인승 'e존'을 비롯해 미니밴,픽업트럭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e존은 한번 충전하면 110㎞(리튬폴리머배터리 기준)까지 달릴 수 있다. 가정용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방전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려면 4시간 걸린다. 전기요금은 한 달 1만원이면 족하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 가격은 납축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1300만원대,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1900만원 수준이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소방서,월드컵 공원 등에 보급하기 위해 NEV 35대를 도입키로 했다.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CT&T 관계자는 "전남 영광군이 도서 지역 내에 전기차 운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1000대 공급계약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CT&T는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날 스피드메이트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와 전기차 전문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
◆전기차보험 개발 안돼
이달 말부터 전기차 운행이 허용돼도 당장 거리를 다니는 전기차를 찾아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당장 자동차보험이 개발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법을 개정한 뒤 자동차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사더라도 일반도로를 다니려면 무(無)보험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다.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선 만든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료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손해보험사 가운데 이 같은 전기자동차를 위한 보험 개발에 착수한 곳은 아직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경험 요율이 없는 데다,속도에 제한을 받고 다닐 수 있는 도로도 한정돼 있어 보험료율 산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당장 개발에 착수한다 해도 출시까지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개발을 끝낸다해도 판매 한 달 전 금감원에 신고해 상품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일반도로가 아닌 골프장 등 특정한 구역을 주행할 경우에는 현재 출시된 일반보험을 통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LIG손해보험이 내놓은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는 보장하지 못하는 일반보험이다.
◆다른 인프라도 부실
다른 인프라도 부실하다. 전기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으려면 우선 각 시 · 도가 조례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법을 고쳐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도,도로 지정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조례를 통해 전기차 도로를 지정한 지자체는 없다.
도로 표시판도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 대부분 도로가 시속 60㎞ 이하이긴 하지만 간선도로 진출입로에 표시판이 없을 경우 초행길의 전기차 운전자로 인해 교통 마비가 올 수 있다.
충전 시설을 갖추는 것 역시 전기차 활성화를 결정지을 중요 요소다. 'e존'은 가정용 콘센트에 꽂아 충전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그렇지만 아파트형 구조에서 충전용 콘센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주차장 기둥벽에 콘센트가 있긴 하지만 과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비상 충전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예컨대 라이트를 켠 채 내려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전기차는 '깡통'이나 다름없다. 이상현 NH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전기차 시장은 인프라가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도 논란
인프라뿐만 아니라 비싼 차값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거리다. 'e존'의 가격은 납축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1300만원이고,리튬폴리머배터리를 장착한 것은 1900만원이다. 기아차 '모닝'이 898만~104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로선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년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하이브리드카에 적용했던 것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은 주기로 했다. CT&T 관계자는 "외국처럼 한국도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조금 문제는 오는 8월부터 등장하게 될 개조 전기차에도 해당된다. 엔진을 빼내고 전기모터,배터리 등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인데 레오모터스가 '모닝'을 개조해 내놓은 모델의 경우 개조 비용이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전기차 시장은 일반 개인보다는 차량 운행을 많이하는 기업이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박동휘/김현석 기자 donghuip@hankyung.com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규정상으로 그럴 뿐,실제 전기차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전소 등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인프라도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 정부보조금도 책정되지 않아 값이 경차보다 비싼 점도 걸림돌이다.
◆도심에 선보일 전기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다만 최고 시속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기차 전문생산업체인 CT&T는 2인승 'e존'을 비롯해 미니밴,픽업트럭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e존은 한번 충전하면 110㎞(리튬폴리머배터리 기준)까지 달릴 수 있다. 가정용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방전상태에서 완전히 충전하려면 4시간 걸린다. 전기요금은 한 달 1만원이면 족하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 가격은 납축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1300만원대,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1900만원 수준이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소방서,월드컵 공원 등에 보급하기 위해 NEV 35대를 도입키로 했다. 다른 지자체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CT&T 관계자는 "전남 영광군이 도서 지역 내에 전기차 운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1000대 공급계약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CT&T는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날 스피드메이트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와 전기차 전문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
◆전기차보험 개발 안돼
이달 말부터 전기차 운행이 허용돼도 당장 거리를 다니는 전기차를 찾아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당장 자동차보험이 개발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법을 개정한 뒤 자동차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사더라도 일반도로를 다니려면 무(無)보험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다.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선 만든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료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손해보험사 가운데 이 같은 전기자동차를 위한 보험 개발에 착수한 곳은 아직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경험 요율이 없는 데다,속도에 제한을 받고 다닐 수 있는 도로도 한정돼 있어 보험료율 산정이 매우 까다롭다"며 "당장 개발에 착수한다 해도 출시까지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개발을 끝낸다해도 판매 한 달 전 금감원에 신고해 상품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일반도로가 아닌 골프장 등 특정한 구역을 주행할 경우에는 현재 출시된 일반보험을 통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LIG손해보험이 내놓은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는 보장하지 못하는 일반보험이다.
◆다른 인프라도 부실
다른 인프라도 부실하다. 전기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으려면 우선 각 시 · 도가 조례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법을 고쳐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도,도로 지정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조례를 통해 전기차 도로를 지정한 지자체는 없다.
도로 표시판도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 대부분 도로가 시속 60㎞ 이하이긴 하지만 간선도로 진출입로에 표시판이 없을 경우 초행길의 전기차 운전자로 인해 교통 마비가 올 수 있다.
충전 시설을 갖추는 것 역시 전기차 활성화를 결정지을 중요 요소다. 'e존'은 가정용 콘센트에 꽂아 충전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그렇지만 아파트형 구조에서 충전용 콘센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주차장 기둥벽에 콘센트가 있긴 하지만 과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비상 충전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예컨대 라이트를 켠 채 내려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전기차는 '깡통'이나 다름없다. 이상현 NH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전기차 시장은 인프라가 수요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도 논란
인프라뿐만 아니라 비싼 차값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거리다. 'e존'의 가격은 납축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1300만원이고,리튬폴리머배터리를 장착한 것은 1900만원이다. 기아차 '모닝'이 898만~104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로선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년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하이브리드카에 적용했던 것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은 주기로 했다. CT&T 관계자는 "외국처럼 한국도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조금 문제는 오는 8월부터 등장하게 될 개조 전기차에도 해당된다. 엔진을 빼내고 전기모터,배터리 등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인데 레오모터스가 '모닝'을 개조해 내놓은 모델의 경우 개조 비용이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전기차 시장은 일반 개인보다는 차량 운행을 많이하는 기업이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박동휘/김현석 기자 donghuip@hankyung.com

![엔비디아 실적 발표…뉴욕 증시 상승세 힘 받을까 [뉴욕증시 주간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A.377860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