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경제판례] "채무자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은행, 채권상계는 부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뒤늦게 직원의 실수를 알게 된 A사는 해당 은행에 김씨를 보내 송금액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 제출하게 했으나 은행 측은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잘못 보낸 6568만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김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A사의 '배달사고' 수습은 만만치 않았다. 김씨와 하나은행의 채무관계 때문이었다. 김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해 근보증계약을 맺었다. 약 2억2000만원의 보증채권을 갖고 있던 하나은행은 김씨의 회사가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김씨의 예금채권과 보증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였다. A사가 6568만원을 잘못 보낸 계좌가 하필이면 이 문제의 계좌였다.
A사는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고,금융감독원은 송금액 반환을 권고했으나 은행 측은 거부했다. 결국 A사는 "잘못된 송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상계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6568만원을 돌려달라는 전부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A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사의 귀책사유로 이뤄진 송금에 대해 은행이 자신의 상계권을 제한할 의무는 없다"며 "착오라 해도 김씨의 예금원장에 기재된 이상 이는 김씨의 예금"이라고 판단,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취소 처리하지 않고 반환만 요구했다면 예금계약 성립"이라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 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사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착오로 송금한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한 경우에도 은행이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것은 공평 · 정의에 합당한 조치가 아니다"며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이 송금 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를 희생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한다면 권리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리를 잘못 찾아갔다가 소송에까지 휘말린 6568만원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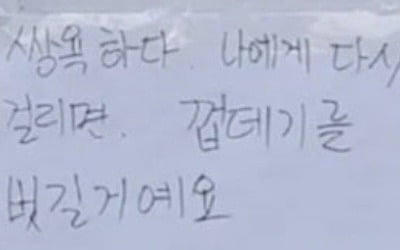



![메타 하루 만에 5.8% 급등…AI 투자 낙관한 월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B20240425071413937.jpg)








![[만화신간] 대만의 소년](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ZK.3726364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