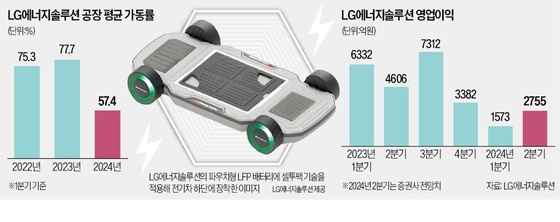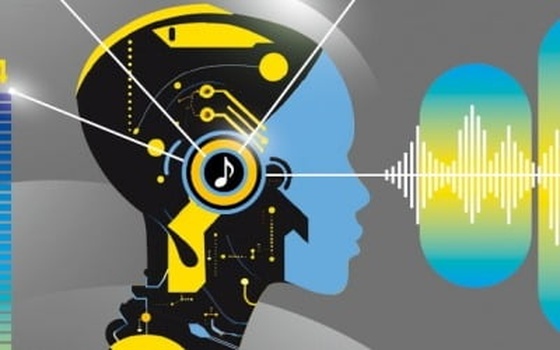"트위터에 올린 글 팀장이 보면 안되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밀계정 만드는 직장인 늘어
그가 비밀 계정을 만든 것은 몇 달 전.별로 친하지 않은 옆 부서 팀장이 자신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차를 내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디에서 뭘했는지 트위터를 보고 다 알고 있었다"며 "순간 기분이 오싹했다"고 했다. 그는 그 뒤 별도의 익명 계정을 만들고 여기에 친한 사람들만 초대,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NS가 확산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가 자신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 그들에게 일상생활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다. SNS에서는 이름 나이 출신학교 직장 등을 공개하고,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맺는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이 드러난다.
직장인들은 과거에 무심코 했던 말들을 직장 상사나 인사 담당자들이 검색을 통해 낱낱이 알게 되는 장면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걸 올리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지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직장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인사담당자 가운데 45%가 SNS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성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헌팅업체 관계자는 "SNS가 활성화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음놓고 SNS를 하려는 직장인들의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익명의 계정을 만들거나 외부인이 볼 수 없게 '프로텍트(보호)'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다. 회사 관계자의 계정을 '블록(차단)'해 자신의 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사례도 나온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가상자산 시장 규제 본격 도입…득일까 실일까 [한경 코알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28693.3.jpg)


![파월 "인플레 완화 경로로 복귀"…달아오른 빅테크, 신고가 랠리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B20240703071605370.jpg)

![[단독] 고삐 풀린 주담대에 '경고등'…금리 인상 나선 국민은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2.332956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