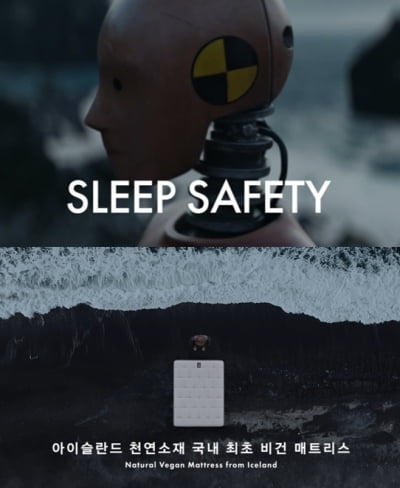구글 러브콜 받은 첨단기술, 국내선 '찬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이꿈 '가상화 영상기술' 美·日서 사업화 추진
'녹색인증' 받아도 판로 못찾아 세제 지원 등 필요
'녹색인증' 받아도 판로 못찾아 세제 지원 등 필요
"해외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지만 마음은 씁쓸합니다. 인증받은 녹색기술로 꼭 국내에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녹색 기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녹색 인증제도'에 대해 "혜택이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국내 시장에서 홀대받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이 오히려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보기술(IT)업체 마이꿈은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영상을 제작 · 복사해 사이버 오염을 줄이는 '가상화 영상기술'로 일본 골든윙(Golden Wing)사로부터 1억엔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현지 진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9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았다. 마이꿈은 최근엔 구글의 러브콜도 받았다. 이 회사는 구글 측과 몇 차례 미팅을 갖고 올 상반기 중 미국 특허가 나오는 대로 기술 인수를 위한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찬밥'신세다. 기술보증기금은 "판매 실적이 없다"며 보증 신청을 거절했고 벤처캐피털도 매출액이 미미하다며 투자의사를 접었다. 지난해 상반기엔 중소기업청 혁신기술 과제로 선정돼 개발자금을 신청했지만 "연구소가 없고 직원 수가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정상국 대표는 "공공기관이 기술보다는 업체의 외형에만 치중해 유망한 기술들의 사업화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전력 낭비를 줄여주는 PC 전력관리 솔루션으로 녹색인증을 받은 유앤비테크도 최근 미국 머피오버시즈US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미국 버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버전이 개발되면 미 연방정부가 사용할 솔루션에 이 기술이 쓰일 예정이다. 김윤철 대표는 "국내 대다수의 기업이 녹색제품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 시장 확산에 애로를 겪었다"며 "비슷한 이유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녹색기술을 역수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여러 번 검증받고도 국내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제조업체인 지에이는 LED 조명 등 방열기술과 관련 사업 등으로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사업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 공공기관 판로확보에는 실패했다. 회사 측은 "판로가 없어 해외 시장에서 살 길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들은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측은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300여 업체 중 상당수는 자금 지원을 받았고 판로개척 마케팅 등 다른 분야의 지원방안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녹색 기술 상품을 구입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공서에서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의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녹색 기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녹색 인증제도'에 대해 "혜택이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국내 시장에서 홀대받은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이 오히려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보기술(IT)업체 마이꿈은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영상을 제작 · 복사해 사이버 오염을 줄이는 '가상화 영상기술'로 일본 골든윙(Golden Wing)사로부터 1억엔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현지 진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9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았다. 마이꿈은 최근엔 구글의 러브콜도 받았다. 이 회사는 구글 측과 몇 차례 미팅을 갖고 올 상반기 중 미국 특허가 나오는 대로 기술 인수를 위한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찬밥'신세다. 기술보증기금은 "판매 실적이 없다"며 보증 신청을 거절했고 벤처캐피털도 매출액이 미미하다며 투자의사를 접었다. 지난해 상반기엔 중소기업청 혁신기술 과제로 선정돼 개발자금을 신청했지만 "연구소가 없고 직원 수가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정상국 대표는 "공공기관이 기술보다는 업체의 외형에만 치중해 유망한 기술들의 사업화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전력 낭비를 줄여주는 PC 전력관리 솔루션으로 녹색인증을 받은 유앤비테크도 최근 미국 머피오버시즈US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미국 버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버전이 개발되면 미 연방정부가 사용할 솔루션에 이 기술이 쓰일 예정이다. 김윤철 대표는 "국내 대다수의 기업이 녹색제품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 시장 확산에 애로를 겪었다"며 "비슷한 이유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녹색기술을 역수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여러 번 검증받고도 국내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제조업체인 지에이는 LED 조명 등 방열기술과 관련 사업 등으로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사업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 공공기관 판로확보에는 실패했다. 회사 측은 "판로가 없어 해외 시장에서 살 길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들은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측은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300여 업체 중 상당수는 자금 지원을 받았고 판로개척 마케팅 등 다른 분야의 지원방안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녹색 기술 상품을 구입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공서에서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의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