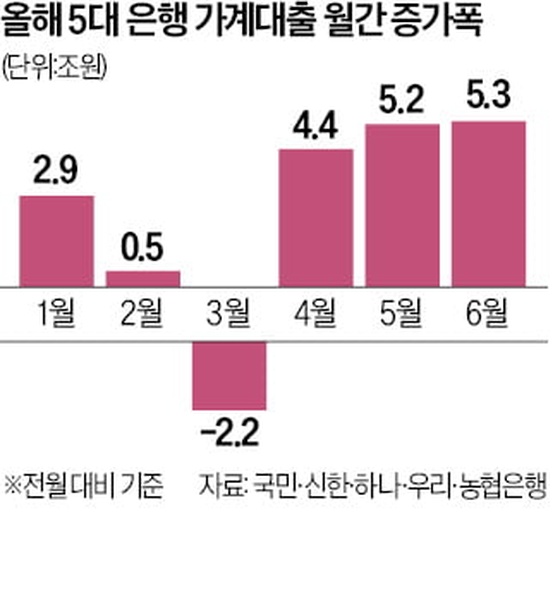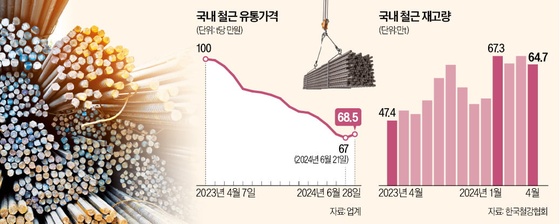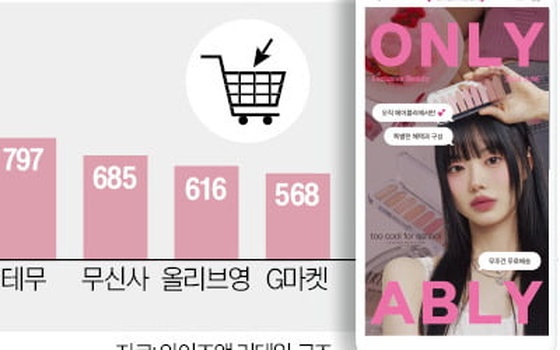대형 조선소 덮친 '유럽發 계약 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박 인도가 미뤄지고 수주 계약 취소 사태까지 겹치면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 조선사들의 위기감도 더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지난 한 달 동안 외국 선사들이 요청한 총 11척에 대한 선박 인도 시점 연기를 받아들였다. 2008년 이후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 5척(7800억원), 벌크선 2척(1230억원), 컨테이너선 4척(7000억원) 등에 대한 인도 시점을 각각 2~3년 연장했다. 이를 포함해 올 들어 총 23척(선종·선형 변경 포함)에 대한 인도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STX 관계자는 “선주사 측과 협의해 인도 시점을 미룬 것으로, 계약을 아예 취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초대형 유조선 3척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으로 선종을 변경하면서 인도 시점을 2015년으로 3년 연기했다. 통상적으로 선주사들은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조선사에 계약 선박의 종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인도 시점을 늦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일부 유럽 선사로부터 선박 인도 연기와 선종 변경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대규모 선박 인도 연기 및 수주 취소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업체에 돈을 빌려준 국내 채권은행들은 이미 23개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재무 구조조정 작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조선소 매각, 위탁 경영, 업종 전환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내 조선 상위 5개 업체의 내년 회사채 차환 물량은 2조1300억원에 이른다.
장창민/이상열 기자 cmjang@hankyung.com

!['제갈량 출사표'에서 배우는 전문경영인의 자세 [조평규의 중국 본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99.1308692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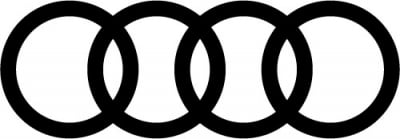


![국채금리 급등에도 동반 상승…나스닥 0.83%↑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1.372143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