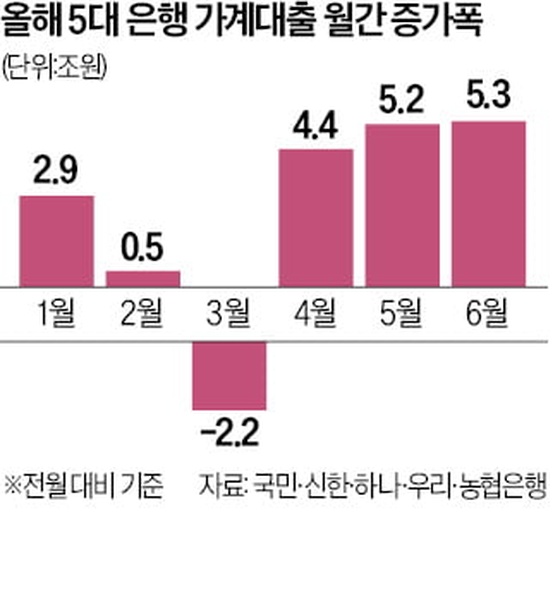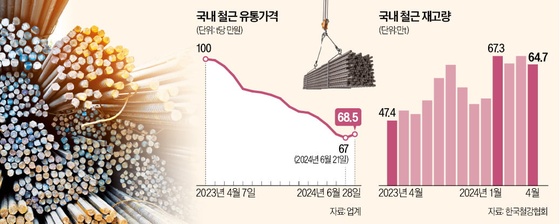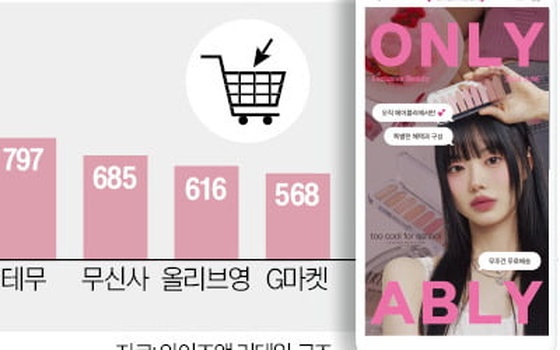[사설] 舊 공산권보다도 反시장적인 한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되레 가격규제가 많아진 것은 인플레 억제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반성장이니 공생발전이니 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 남발된 탓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기름값 및 각종 수수료 인하조치가 대표적이다. 실제 전경련이 파악한 656개 가격규제 중 35%는 물가안정 이외 목적의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66%가 가격규제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업의 의견이 80% 이상 반영된다는 비율은 9%에 불과했다.
문제는 가격규제가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까닭에 숱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가격은 잠시 낮아질지는 모르나 기업수익성 악화와 상품품질 저하, 공급 위축 등으로 결국 또 다른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암시장을 키우고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현실적인 대부업 이자율 제한이 불법 대부업체를 양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악순환 또한 만만치 않다. 기름값 인하가 효과가 없자 정부가 다음 카드로 밀어붙이고 있는 알뜰주유소가 바로 그런 사례다.
인위적으로 억누른 가격은 언제든 다시 튀어오르고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그것이 ‘표’를 의식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가격이 ‘보이는 손’에 의해 결정될지 걱정이다.
![절대 왕정 뺨치는 LVMH의 치밀한 '승계 플랜'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15549.3.jpg)

![[한경에세이] 파리올림픽의 세 가지 도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7211274.3.jpg)


![국채금리 급등에도 동반 상승…나스닥 0.83%↑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1.372143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