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전라북도보다 작은 북한 경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학영 편집국 부국장 haky@hankyung.com
![[이슈 프리즘] 전라북도보다 작은 북한 경제](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1122847971&indate=20110509&photoid=201012263810&size=1)
화두의 주어를 바꿔보자. 북한과 전라북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고. 공통점은 역시 총소득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북한은 1년에 30조원을 벌어서 2418만명이 나눠 갖고, 전북은 32조원을 벌어서 187만명이 나눠 갖는다(통계청·한국은행 2010년 추정 통계치).
선군정치’ 피눈물 흘리는 민생
탄자니아와 골드만삭스는 우연하게도 연간 총소득이 비슷했을 뿐이다. 그 밖엔 공통점이랄 게 없다. 탄자니아는 높은 문맹률의 전형적인 저개발국가다. 골드만삭스는 우수한 인재와 첨단 금융기법으로 뭉친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IB)이다. 그런 두 곳을 맞비교하는 것은 어색하다.
전북(대한민국)과 북한은 그렇지 않다.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 외형 조건과 잠재력은 어떤가. 영토 면적이 전북은 8048㎢다. 북한은 12만2762㎢로 대한민국 전체(9만9373㎢)보다도 넓다. 게다가 전북은 ‘2010년 지역소득’ 통계에서 1인당 소득이 대한민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에 그친 곳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한국 전체의 3%남짓에 불과하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쪽보다 경제력이 우세했다. 일제(日帝)가 남쪽보다 훨씬 더 많이 물려준 중공업 공장에다 머리 좋고, 근면하고, 생활력 강한 사람들에 막대한 광물자원까지 갖춘 덕분이었다. 그런 북한이 어쩌다 지금과 같은 지경이 됐을까.
한국에 있고, 북한엔 없는 것
사회주의 진영의 두 맹주(盟主)였던 중국과 러시아(옛 소련)가 체제의 치명적 한계를 고민한 끝에 개혁·개방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1980~90년대 초반이었다. 선발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을 빠르게 추격하며 ‘BRICs’의 선두주자로 올라선 것은 그 결실이었다.
북한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오로지 군사력 강화에만 매달렸다. 말 그대로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선군(先軍)정치’였다. 군비를 증강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알량한 내부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걸 갖고 ‘한반도 안정’을 흥정하며 국제 동냥질을 하면 된다는 심산이었다.
그리고 대망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원년’을 호언했다. 구호는 거창하지만 식량과 에너지 확보, 주택 10만채 건설이 3대 실천 목표라는 게 민망하다못해 허망하다. 그나마도 온갖 건설자재를 탈탈 털어서 ‘전시(展示)용 도시’ 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외에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북한 지도부는 민생을 파탄 낸 김정일 사후(死後)에도 ‘선군정치’의 흔들림 없는 승계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 주말 참석한 중소기업 무역인들의 송년모임에서 남북한의 엇갈린 성취가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새삼 절감했다. 기업다운 ‘기업’의 존재 유무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선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파괴적 집단미망의 결과는 이미 판가름났다. 가증스런 가면극을 이젠 끝낼 때다.
이학영 편집국 부국장 hak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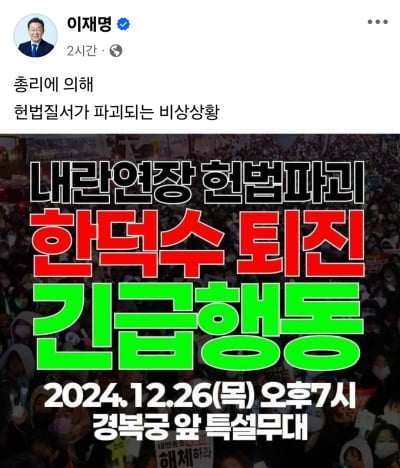

!['美점령군'·'日패악질'이라더니…이재명 "애정 깊다" 무슨 일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862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