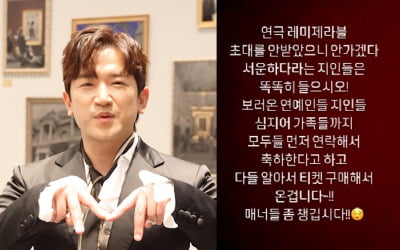[책마을] 무심코 클릭하는 순간, 구글은 당신의 '스토커'가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 얼굴의 구글
스코트 클리랜드 외 지음 / 박기성 옮김 / 에이콘출판 / 468쪽 / 1만9800원
무료 제공 G메일 내용 스캔, 맞춤 광고용 키워드로 활용
사생활 침해 = 광고 수익 "이제 그 이면을 봐야할 때"
스코트 클리랜드 외 지음 / 박기성 옮김 / 에이콘출판 / 468쪽 / 1만9800원
무료 제공 G메일 내용 스캔, 맞춤 광고용 키워드로 활용
사생활 침해 = 광고 수익 "이제 그 이면을 봐야할 때"
그게 구글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기술(IT) 애널리스트 스코트 클리랜드는 “우리는 정말 구글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고 언한��. 그러면서 “구글은 공정한 검색 결과, 공짜 이메일, 유용한 광고를 선사하는 젊은 기업인지 아니면 사생활을 짓밟고, 저작물을 강탈하며, 웹을 지배하는 티라노사우르스인지 가려보자”고 제의한다. 새 책 《두 얼굴의 구글》을 통해서다.
저자는 티라노사우르스를 마스코트로, ‘사악해지지 말자’를 모토로 삼고 있는 구글을 ‘음험한 빅 브러더’로 간주한다. 구글은 ‘검색’ ‘동영상 공유’ ‘위치기반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무도 모르게 개인 사생활 정보를 채집하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무르는 ‘전지전능에 근접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구글의 수익모델은 곧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타깃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많이 축적할수록 돈을 더 버는 모델이다. “구글의 수익모델 관점에서 보면 이용자들은 ‘상품’에 불과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교묘하게 회피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구글은 사용자들 모르게 ‘프라이버시’를 빼앗는다. 구글의 개인컴퓨터 검색솔루션인 구글데스크톱은 개인 PC에 담긴 모든 파일을 스캔하고 색인화한다. ‘구글데스크톱을 개선하는 데’ 동참한다는 옵션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제한된 분량의 비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데스크톱 버전3는 파일 색인이 아니라 실제 파일을 복사해 구글 서버에 저장한다. 구글 문서도구들을 사용할 때에도 구글은 임시저장본을 포함해 각자의 업무문서와 개인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휴지통까지 파헤친다”는 것이다.
구글의 무료 이메일 서비스 G메일도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다. 구글은 광고용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스캔하도록 해두었다. G메일을 쓸 때는 이용자와 원하는 수신인, 구글 사이의 3자 대화가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이용자들이 삭제한 이메일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처럼 어제든지 체크아웃은 할 수 있지만 떠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또 저자는 스트리트뷰를 ‘산업적 규모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사례’로 꼽는다. 스트리트뷰를 촬영하는 차량들은 주변의 와이파이(무선 근거리 네트워크)를 스캔해 주소를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구글 계정이 없는 개인의 위치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은 “구글의 ‘와이스파이’ 작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청사건의 하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구글툴바도 프라이버시의 적이다. 구글툴바는 사용자가 방문한 모든 사이트를 구글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웹히스토리는 사용자가 어떤 웹페이지에 어느 정도 빈도로 재방문하는지 구글에게 낱낱이 알려준다. 구글래티튜드 또한 ‘스토커’처럼 사용자를 따라붙는다.
저자는 “구글은 사용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의 언제나 알리지도 동의를 받지도 않는다”며 “‘구글하다’의 숨겨진 이면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