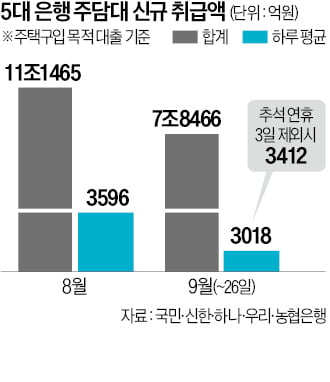중남미 "美·日 양적완화는 新보호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페루·멕시코 등 4개국, 브라질 '환율 전쟁' 비판에 가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과 일본 등의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에 반발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멕시코와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브라질 혼자 미국의 양적완화를 비판해온 것과 달라진 양상이다. 중남미 국가들도 통화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브라질 이어 멕시코 등 4개국도 가세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최근 들어 선진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페루 재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FT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글로벌 과잉 유동성으로 진단하고 “페루 같은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펠리페 라레인 칠레 재무부 장관도 지난주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새로운 보호무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늘어나는 해외 자금 유입으로 형성되고 있는 자산버블이 조만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멕시코 등 4개국의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는 지난 1년간 10% 이상 올랐다.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한 2009년 이후를 기준으로 칠레와 콜롬비아는 30% 이상, 페루는 20% 이상 통화가치가 평가절상됐다. 통화가치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간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일본 엔화의 가치절하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양적완화에 다른 선진국이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FT는 “빠른 통화가치 절상에 대한 각국 국민과 수출업자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정치인들도 무언가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브라질식 맞대응 주목
멕시코 등은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다. 외채 상환을 명목으로 달러를 사들이거나 이자율을 낮춰 자국 채권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국내 자산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들 국가 사이에 ‘브라질식 해결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브라질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자국 헤알화가 급등하자 2010년 9월 통화전쟁을 선언하고 외국인의 브라질 채권 매매에 6%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외 자금 유입을 통제했다. 적정 헤알화 가치는 달러당 2.0~2.1헤알 수준으로 정해 이를 벗어날 경우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카르데나스 장관은 “당장 시장 조작에 나설 생각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 통제 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른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암 투병 중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8일 볼리바르화 가치를 32% 절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25% 늘리는 과정에서 빠르게 팽창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유화한 석유의 해외 판매로 얻어지는 자국 통화 환산 수입은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브라질 이어 멕시코 등 4개국도 가세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최근 들어 선진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페루 재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FT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글로벌 과잉 유동성으로 진단하고 “페루 같은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펠리페 라레인 칠레 재무부 장관도 지난주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새로운 보호무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늘어나는 해외 자금 유입으로 형성되고 있는 자산버블이 조만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멕시코 등 4개국의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는 지난 1년간 10% 이상 올랐다.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한 2009년 이후를 기준으로 칠레와 콜롬비아는 30% 이상, 페루는 20% 이상 통화가치가 평가절상됐다. 통화가치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간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일본 엔화의 가치절하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양적완화에 다른 선진국이 가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FT는 “빠른 통화가치 절상에 대한 각국 국민과 수출업자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정치인들도 무언가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브라질식 맞대응 주목
멕시코 등은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다. 외채 상환을 명목으로 달러를 사들이거나 이자율을 낮춰 자국 채권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국내 자산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들 국가 사이에 ‘브라질식 해결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브라질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자국 헤알화가 급등하자 2010년 9월 통화전쟁을 선언하고 외국인의 브라질 채권 매매에 6%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외 자금 유입을 통제했다. 적정 헤알화 가치는 달러당 2.0~2.1헤알 수준으로 정해 이를 벗어날 경우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카르데나스 장관은 “당장 시장 조작에 나설 생각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 통제 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른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암 투병 중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8일 볼리바르화 가치를 32% 절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25% 늘리는 과정에서 빠르게 팽창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유화한 석유의 해외 판매로 얻어지는 자국 통화 환산 수입은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가는 곳마다 중국산 아니냐고 물어봐요"…전기차 오너 '분통'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79264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