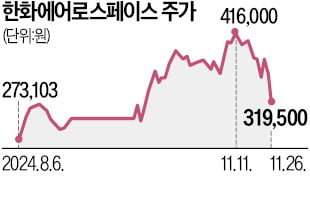[취재수첩] 누굴 위해 비싼 휘발유 수입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정현 산업부 기자 hit@hankyung.com
“경유는 환경 기준이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휘발유는 우리나라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휘발유를 수입해 팔려면 몇 단계 공정이 더 필요하니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한 정유사 관계자는 휘발유를 수입할 때 단가가 높아지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럼에도 휘발유 수입에 앞장선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국내 정유사들의 독점구조를 깨겠다며 지난해 10월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중국 국영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와 휘발유 10만배럴 도입 계약을 맺었다. 6000배럴을 시작으로 11월에 2만7980배럴, 12월에 4만9970배럴로 물량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국내 정유사들이 수출하는 단가보다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한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들여온 지난해 12월 본선 인도(FOB) 기준 수입단가는 배럴당 120달러였다. 같은 기간 국내 정유사들이 동남아 등으로 수출한 물량의 단가는 118달러다. 전달도 가격 차이는 비슷했다.
왜 차이가 났을까. 국내 휘발유 품질 기준을 맞추려면 페트로차이나 일본 투자회사인 JX에너지 오사카공장에서 생산한 휘발유를 대만으로 가져가 6 대 4 비율로 싱가포르산 나프타를 섞어야 한다. 국내 기름값 안정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로 ‘다국적 제품’을 만들다 보니 휘발유 수입 가격이 되레 높아졌다.
휘발유를 포함해 경유 등 석유제품은 지난해 반도체를 제친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었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총 6957만9000배럴이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그 물량의 90%가 넘는 6349만2000배럴의 휘발유를 수출했다. 최고 수출 실적에도 지난해 국내 1위 정유사 SK이노베이션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0.5%에 불과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정유부문에서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내에서 정제한 휘발유를 소비하고도 남아 수출하는 마당에 정부는 정유사들의 수출 가격보다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페트로차이나로부터 10만배럴의 휘발유를 더 도입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들여오면 손해보는 장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중단하면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윤정현 산업부 기자 hit@hankyung.com
그럼에도 휘발유 수입에 앞장선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국내 정유사들의 독점구조를 깨겠다며 지난해 10월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중국 국영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와 휘발유 10만배럴 도입 계약을 맺었다. 6000배럴을 시작으로 11월에 2만7980배럴, 12월에 4만9970배럴로 물량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국내 정유사들이 수출하는 단가보다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한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들여온 지난해 12월 본선 인도(FOB) 기준 수입단가는 배럴당 120달러였다. 같은 기간 국내 정유사들이 동남아 등으로 수출한 물량의 단가는 118달러다. 전달도 가격 차이는 비슷했다.
왜 차이가 났을까. 국내 휘발유 품질 기준을 맞추려면 페트로차이나 일본 투자회사인 JX에너지 오사카공장에서 생산한 휘발유를 대만으로 가져가 6 대 4 비율로 싱가포르산 나프타를 섞어야 한다. 국내 기름값 안정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로 ‘다국적 제품’을 만들다 보니 휘발유 수입 가격이 되레 높아졌다.
휘발유를 포함해 경유 등 석유제품은 지난해 반도체를 제친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었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총 6957만9000배럴이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그 물량의 90%가 넘는 6349만2000배럴의 휘발유를 수출했다. 최고 수출 실적에도 지난해 국내 1위 정유사 SK이노베이션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0.5%에 불과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정유부문에서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내에서 정제한 휘발유를 소비하고도 남아 수출하는 마당에 정부는 정유사들의 수출 가격보다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페트로차이나로부터 10만배럴의 휘발유를 더 도입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들여오면 손해보는 장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중단하면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윤정현 산업부 기자 hit@hankyung.com

![[속보]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7576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