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한식…품을 들이다, 모던을 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30대 셰프들의 정성어린 음식설명
제철재료 사용위해 매달 코스메뉴 변경
도예가 작품에 담긴 요리는 한폭의 그림
기업임원·외국인들 비즈니스 장소 각광

서울 남산에 걸터앉은 모던 한식당 ‘품 서울’의 첫인상은 이랬다. 품 서울은 조선 양반들이 먹던 반가음식(班家飮食)을 지극히 서구적 방식인 코스 요리로 선보인다. 신선한 재료와 고급스런 맛은 기본이고, 음식을 담아내는 법과 식당 인테리어에서도 ‘보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기업 임원들의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이들의 음식은 서양적 요소를 섞은 퓨전 한식이 아니라 정통 한식이다. 따라주는 물도 우엉이나 검은콩을 달여 구수한 한국의 맛을 냈다. 찬 것은 차게, 뜨거운 것은 뜨겁게 즐길 수 있도록 코스로 제공된다. 노승혁 매니저는 “예약의 대부분이 비즈니스 미팅이고 외국계 회사에서 특히 많이 온다”고 말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장·차관들도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자주 찾는 곳이다.

코스 선택은 간단하다. 점심으로는 각각 6단계 요리가 나오는 품위상(5만원)과 품격상(7만원)이 있다. 저녁으론 8단계짜리 위품상(10만원)부터 9단계의 기품상(15만원), 12단계의 상품상(25만원) 중 고를 수 있다. 채식주의자용 코스도 따로 있다.

한층 걸어 올라가면 옥상이 나온다. 유리창을 통해 봤던 서울 풍경이 더욱 시원하게 펼쳐져 마음이 개운해진다. 남산타워도 보인다. 옥상에는 크기가 다른 장독이 10여개쯤 옹기종기 모여 있다. 품 서울에서 실제 사용하는 된장과 고추장이 담겨 있단다.
품 서울은 모든 직원이 셰프다. 정기적으로 주방과 홀을 바꿔가며 맡는다. 음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품 서울이 유명해지면서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나 호텔 관계자들이 ‘손님인 척’ 와서 정보를 캐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노 매니저는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나 질문 몇 가지만 봐도 일반 고객인지 아닌지 다 안다”며 “그래도 모든 질문에는 성실히 답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포토] 한글자 한글자 정성껏](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24469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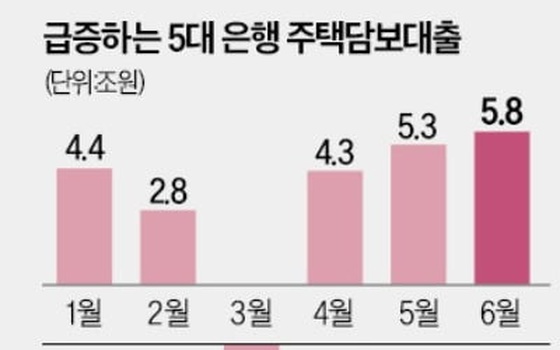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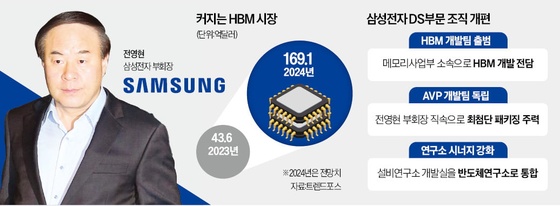





![[신간]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 자서전 '레드 엠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ZK.3724641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