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창업 꿈꾼다면 3~4년내 승부봐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VC 벤처를 키우는 사람들 (1) 강석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이사
창업실패 경험 후 VC세워
2006년부터 초기벤처 집중 투자
"웨어러블, 창업의 새 기회될 것"
창업실패 경험 후 VC세워
2006년부터 초기벤처 집중 투자
"웨어러블, 창업의 새 기회될 것"

“지금처럼 창업하기 좋은 시기는 없어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올리면 바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셈이니까요.”
지난달 24일 서울 역삼동 인근에서 만난 강석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본엔젤스) 이사(사진)는 “예전에는 좋은 기술이 있어도 통신사나 제조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창업을 꿈꾼다면 모바일 시장이 성숙하기 전인 향후 3~4년이 특히 도전해볼 만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가 일하는 본엔젤스는 국내에 초기 기업 투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초기 기업을 발굴·투자해온 벤처캐피털이다.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가 2006년 시작해 초기 기업 전문 벤처캐피털 시스템을 갖춰 나갔다. KT가 인수한 ‘엔써즈’, SK플래닛이 인수한 ‘매드스마트’를 비롯해 최근 네이버가 사들인 ‘퀵켓’ 등이 본엔젤스가 투자해 성공적으로 팔린 회사들이다.
창업자 출신인 강 이사는 “직접 창업하며 겪은 어려움을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20대 중반 벤처기업 올라웍스를 창업해 인텔에 매각한 류중희 인텔코리아 상무와 바코드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창업한 경험이 있다. 강 이사는 “1999년 말에 창업했는데 당시 쓰이던 피처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지 않았다”며 “직접 바코드 인식기기 시제품을 만들어가며 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기획력을 갖췄어도 지금처럼 ‘앱 장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다. 강 이사는 “직접 통신사와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등 기술개발 이외 어려움이 더 많았다”며 “창업 초기 자비로 실리콘밸리에 다녀왔는데 현지 벤처생태계 문화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때의 경험이 벤처캐피털 활동에 녹아들었다. 강 이사는 “국내에도 1차 벤처 붐이 불면서 벤처캐피털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창업 때 느꼈던 체계화된 역할이 절실했다”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본엔젤스는 투자 업무 외에도 모바일 개발자를 양성하는 ‘매드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강 이사는 “앱 성장세가 둔화하고 사람들이 늘 쓰던 앱만 고집하는 등 모바일 시장은 서서히 성숙해가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는 어디서나 열리고 있다”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앱 장터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웨어러블·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정보기술(IT) 붐은 생각지 못한 창업 아이템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갭을 메우는 서비스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는 “최근 벤처가 속속 생겨나면서 창업자들이 투자사도 신중하게 골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잘 알지 못하는 벤처캐피털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투자금액보다 자신이 원하는 조언을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 강 이사와 송인애 이사가 투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본엔젤스는 자본금 80억원과 페이스메이커 펀드 22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글=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사진 =신경훈기자 nicerpeter@hankyung.com
!['공짜' OTT 광고형 요금제 풀렸다…넷플릭스·티빙 '혈투' [정지은의 산업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9684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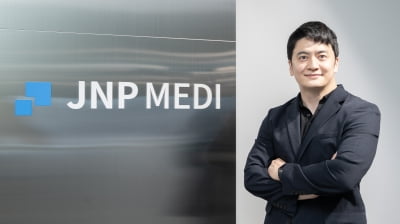
![이러다 비트코인 다 망할라…"벌써 2000만원 넘었어요"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4429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