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 갇힌 국가 R&D] "출연硏엔 현장서 쓸만한 기술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완성도 떨어져 추가 개발비 더 들어
경기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한 도금업체 사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R&D 기술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 영세한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우리가 요청해서 특정한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해도 전문성이 떨어져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는 연구소들은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장비 기업인 H사 기술담당 이사는 “국가 R&D 과제를 신청해 예산을 받는 기업 중 상당수는 실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R&D 예산만 따내서 연명하는 사실상 좀비기업”이라며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아 ‘실질적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기술을 어렵게 찾아도 완성도가 떨어져 추가로 개발비를 들여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사업화 과정에서 큰돈을 쓰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 PC를 납품하는 C사는 2012년 한 출연연에서 8500만원을 주고 한 대의 PC를 네 명이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이전받았다.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냈지만 타깃으로 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 없던 제품이어서 도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전문기업인 루멘스의 유태경 회장은 “출연연의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기업과 연구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경제단체나 각종 협회가 나서서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농심, 이 악물었다"…K라면 '본고장 맛' 본 외국인들 '환호'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4523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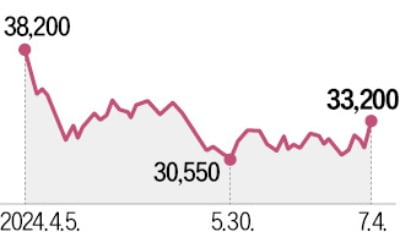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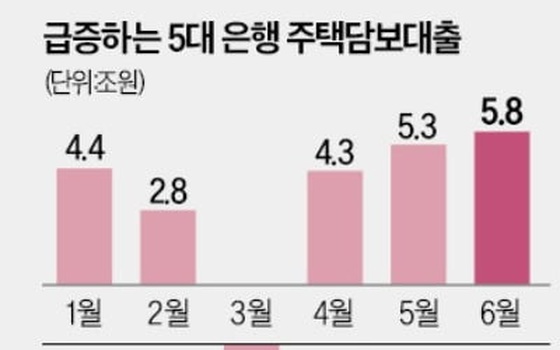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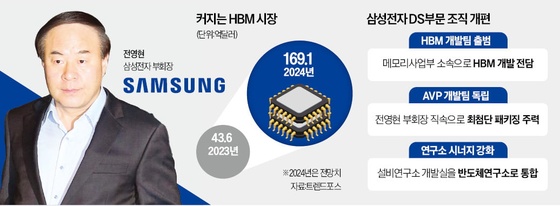





![[신간]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 자서전 '레드 엠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ZK.3724641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