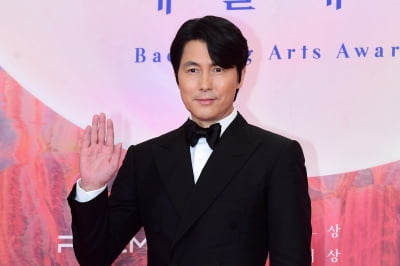[이슈+] '신경숙 쇼크' 2라운드…"어디까지가 표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표절·주례사비평, 문학 특수성 감안한 자정대책 나와야

대다수 문학평론가들은 표절 논란을 진작 논의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데 공감했다. 신씨의 단편 ‘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은 지난 2000년에도 제기됐지만 흐지부지 됐다. 문제제기가 문단에서 공론화되지 못했고, 곪은 상처가 이번에 터졌다.
신씨의 작품을 가장 많이 펴낸 출판사인 문학동네 편집위원 신형철 문학평론가는 앞서 표절 의혹에 대해 “같은 것을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장의 ‘뜻’만이 아니라 ‘표현’이 같고 그것들의 ‘배열’도 일치한다. ‘문장’ 단위라면 몰라도 ‘단락’ 단위에서 또렷한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로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학평론가인 권성우 숙명여대 교수(한국어문학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경숙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 문학적 애정 이상의 과도한 의미부여, 영혼 없는 주례사 비평에 가까웠다. 어떤 비평적 자의식도,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문학동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표절 자체도 문제지만 주례사 비평이 문제를 키웠다는 얘기다.
다만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표절 문제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에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적 해결보다는 문단과 출판계 전체가 자성하고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학평론가는 “고발로 시비가 가려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문학작품의 표절 문제는 연구논문보다 더 복잡하다. 작품의 표현과 플롯(구성)까지 다양한 층위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절 대상이 여러 층위에 걸쳐 있고, 문학작품의 표절 판정기준도 확립돼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문표절 검증 잣대를 문학작품에 들이댈 수는 없다. 척도가 다른 사안”이라며 “작품의 콘텍스트(문맥) 속에서 봐야지, 소설의 문장 몇 개나 단어 배열로 표절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건 경솔할 수 있다. 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모색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예컨대 기존 작품의 인용을 문학적 표현방식의 일종인 패러디나 오마주로 볼지, 아니면 표절로 치부할지 따위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학평론가들은 외국 사례를 봐도 문학작품에 대한 표절 기준을 명시한 케이스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학작품 표절의 경우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별개란 설명도 뒤따랐다.
또 다른 문학평론가 겸 대학 교수는 “논란이 된 주례사 비평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개념을 잡고 지적하는 것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작품 비평이나 해설도 어떤 계기나 수요로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온다. 반성은 필요하지만 ‘문학 비평은 이래야 한다’는 경직된 분위기로 흘러선 곤란하다”고 역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