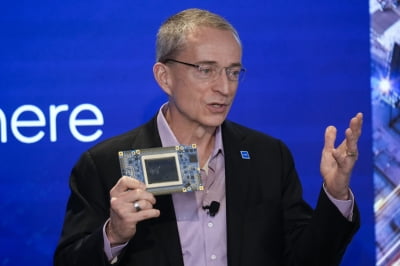[기로에선 공인회계사] (2)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에서도 개봉됐던 영화 "월 스트리트"의 한장면. 월가를 주름잡는
M&A(기업매수합병)거물이 주주총회에서 주주자격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단상에 앉아있는 임원들을 노려보면서 판공비만 축내는 무능한
경영진이라고 퍼붓는 비난이 다른 주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다.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보고서가 있어야 이같은 비판도 나올수 있다.
회계사들은 요즘 무척 바쁘다. 매년10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3월말까지가
회계감사 시즌이기 때문이다. 주로 젊은 회계사들이 기업 현장에 나가
12월말의 결산을 대비한 중간체크를 하는 시기이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이 나름대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제3자입장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남겨야한다.
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공인회계사들도 자신이 만든 "제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를
추산해 볼수가 없다. 단지 상상으로만 그려본다.
자신이 회계감사한 보고서를 보고 증권사객장 한 모퉁이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대출가능여부를 심사하는 은행원,돈을 회수해야할지
고민하는 사채업자에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대로 이해관계자가 없어
자신이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서
공인회계사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돼있다. 금전적인 책임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공인회계사들에게 "제품"을 만드는 수고의 댓가를 지불하는 쪽은
기업이다. 자산규모가 5백억원인 기업은 1천5백3만원,1천억원인 기업은
1천7백3만원 등으로 자산규모별로 세분화돼있다. 이 감사보수는
회계사업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수인상률이 인플레도 제대로 반영해오지 못했다고 회계사들의
불만이 대단한 부분이다.
문제는 감사보고서(제품)를 이용하는 사람과 보고서작성 비용을 대는
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같은 불조리에서 공인회계사의 갈등은
시작된다.
"오후에 도착한 회계사에게 내일 아침까지 예비감사를 끝내 줄것을
명령조로 요구하는 사장도 있습니다"
세동회계법인의 신용인전무는 회계사들의 어깨를 축처지게 만드는
회계문화의 부재를 꼬집는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회사경영진은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말썽의 소지가 없어지고 회사주인(주주)들도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 보고서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감사절차를 자랑하는
회계사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경우엔 그렇지 못하다.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시 되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 시시비비가 다 가려져있는 "양질"의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와 이사람 저사람이 다 뒤져볼수있게되는게 기업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현실적으로 회계사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보수를 주는 기업이 회계사(감사인)선택권을 사실상
쥐고있기 때문이다.
"일감(회계감사)을 맡기위해 혈연 지연 학연등 온갖 끈이 총동원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감사보수가 덤핑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의 기고문이
공인회계사회 월간지에도 등장할 정도이다.
공인회계사회의 진병선부회장같은 사람은 "엄격한 회계감사를 높이 평가해
회계사를 선택하는 기업은 없다"고 장담한다.
지난82년부터 기업이 회계사(감사인)를 선택하는 이른바 자유수임제가
채택된 이후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그 이전엔 정부가 감사대상 기업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주는 제도(배정제)였는데 회계사업계내에서도 찬반이
나눠정도로 문제가 많아 폐기됐다.
회계사들은 지난91년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목격한 이후
공인회계사제도가 지니고 있는 불조리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제도아래서
회계사들의 윤리강령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의문이다.
<양홍모기자>
M&A(기업매수합병)거물이 주주총회에서 주주자격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단상에 앉아있는 임원들을 노려보면서 판공비만 축내는 무능한
경영진이라고 퍼붓는 비난이 다른 주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다.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보고서가 있어야 이같은 비판도 나올수 있다.
회계사들은 요즘 무척 바쁘다. 매년10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3월말까지가
회계감사 시즌이기 때문이다. 주로 젊은 회계사들이 기업 현장에 나가
12월말의 결산을 대비한 중간체크를 하는 시기이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이 나름대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제3자입장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남겨야한다.
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공인회계사들도 자신이 만든 "제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를
추산해 볼수가 없다. 단지 상상으로만 그려본다.
자신이 회계감사한 보고서를 보고 증권사객장 한 모퉁이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람,대출가능여부를 심사하는 은행원,돈을 회수해야할지
고민하는 사채업자에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대로 이해관계자가 없어
자신이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서
공인회계사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돼있다. 금전적인 책임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공인회계사들에게 "제품"을 만드는 수고의 댓가를 지불하는 쪽은
기업이다. 자산규모가 5백억원인 기업은 1천5백3만원,1천억원인 기업은
1천7백3만원 등으로 자산규모별로 세분화돼있다. 이 감사보수는
회계사업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수인상률이 인플레도 제대로 반영해오지 못했다고 회계사들의
불만이 대단한 부분이다.
문제는 감사보고서(제품)를 이용하는 사람과 보고서작성 비용을 대는
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같은 불조리에서 공인회계사의 갈등은
시작된다.
"오후에 도착한 회계사에게 내일 아침까지 예비감사를 끝내 줄것을
명령조로 요구하는 사장도 있습니다"
세동회계법인의 신용인전무는 회계사들의 어깨를 축처지게 만드는
회계문화의 부재를 꼬집는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회사경영진은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말썽의 소지가 없어지고 회사주인(주주)들도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 보고서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감사절차를 자랑하는
회계사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경우엔 그렇지 못하다.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시 되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 시시비비가 다 가려져있는 "양질"의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와 이사람 저사람이 다 뒤져볼수있게되는게 기업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현실적으로 회계사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보수를 주는 기업이 회계사(감사인)선택권을 사실상
쥐고있기 때문이다.
"일감(회계감사)을 맡기위해 혈연 지연 학연등 온갖 끈이 총동원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감사보수가 덤핑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의 기고문이
공인회계사회 월간지에도 등장할 정도이다.
공인회계사회의 진병선부회장같은 사람은 "엄격한 회계감사를 높이 평가해
회계사를 선택하는 기업은 없다"고 장담한다.
지난82년부터 기업이 회계사(감사인)를 선택하는 이른바 자유수임제가
채택된 이후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그 이전엔 정부가 감사대상 기업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주는 제도(배정제)였는데 회계사업계내에서도 찬반이
나눠정도로 문제가 많아 폐기됐다.
회계사들은 지난91년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목격한 이후
공인회계사제도가 지니고 있는 불조리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제도아래서
회계사들의 윤리강령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의문이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