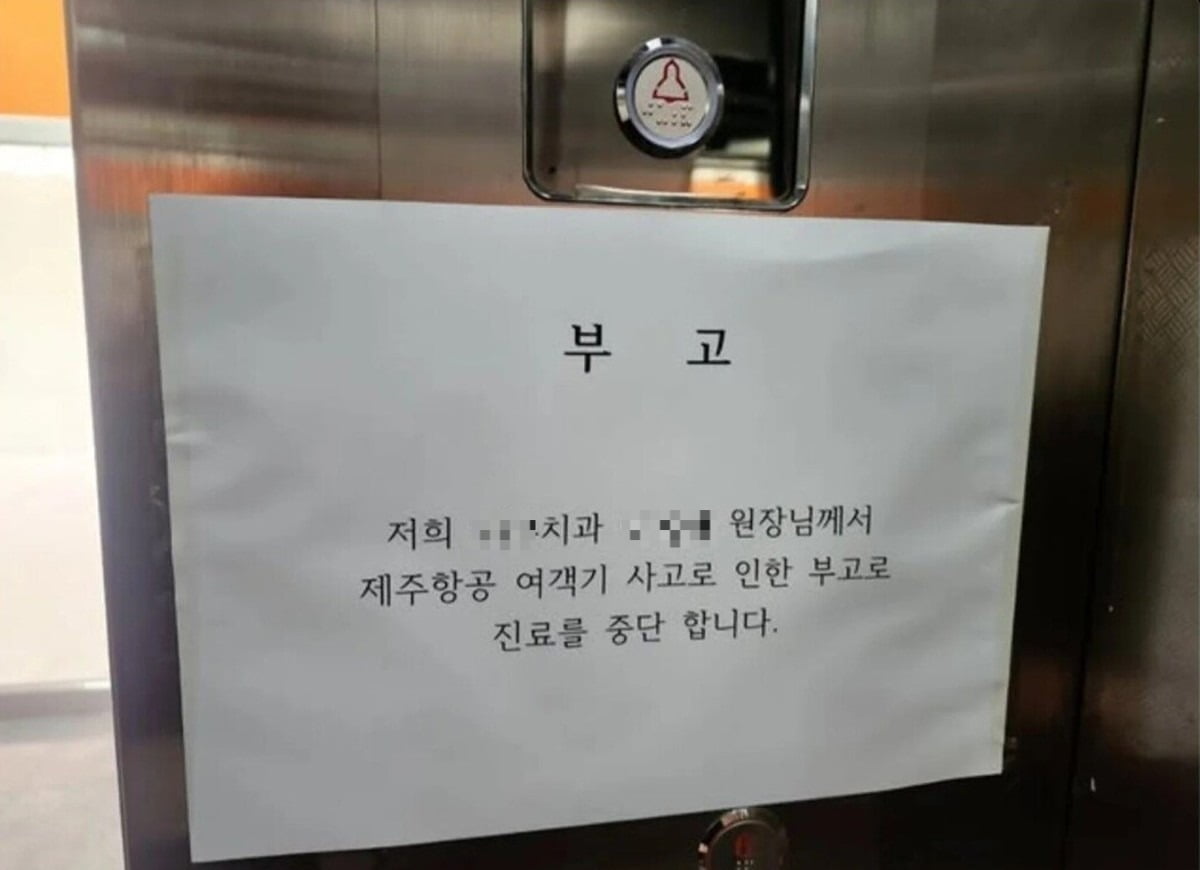딱 질색이다. 대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주위
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열심히 해나간다.
16-26일 서울서초동 삼풍갤러리(593-8708)에서 갖는 그릇전은 이씨의
그같은 고집과 소신을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90년 작업장을 서울의 건물지하에서 경기도 송추쪽으로 옮기면서 마음
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었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산을
보면서 산처럼 볼 때마다 듬직하면서도 새로운 기분을 가져다주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이씨는 그때부터 대학 졸업후 근 20년동안 사용하지 않던 물레를 다시
꺼냈다고 말한다.
"그릇이야말로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조형물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듯,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듯한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 눈떴다고나
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알 수 없는 오브제보다 분명한 용도가 있는
그릇쪽이 오히려 신경써서 만들어야 할 제 몫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도예계에 유행처럼 퍼져있는 오브제나 도조작품을 만드는 일에서
용기를 만드는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한데 대한 변이다.
90년(토아트스페이스)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한 이번 그릇전의 출품작은
찻상 과반 설탕프림세트 다기세트 병 대접 공기등 갖가지 생활 용품들.
산청토에 옹기토를 섞어 만든 태토로 형태를 만들어 구운 초벌에 화장토를
씌우고 그림을 그려 다시 섭씨 1천2백60도의 불로 구워 만든 분청작품
들이다.
"도자의 오브제화나 도조화가 조형체험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대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시류에 따른 동화현상처럼 번져 그릇자체를
퇴화해버린 형식의 틀로 간주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자의 전통과 도자고유의 특성에 미뤄볼 때 그릇이라는 기야말로
우리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 오늘을 사는 내모습을 담은
그릇을 만들고자 한다고.
실제로 그의 그릇들은 더할나위 없이 편안해보인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서구화된 생활양식에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기능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씨는 홍익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번이 통산 여덟번째 개인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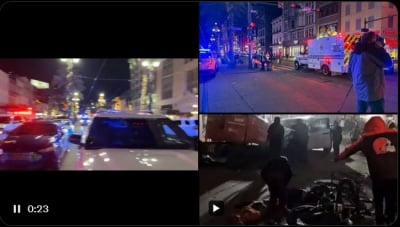
![[속보] "美뉴올리언스서 차량 돌진 10명 사망, 30명 부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비행기 앞자리 돈 더 주고 앉았는데 이젠"…안전석은 어디 [차은지의 에어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99.2464215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