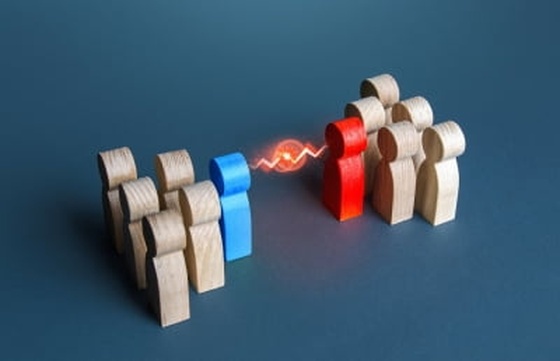대기업참여 사실상 제한효과..공기업민영화 정책보완 배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막지않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쟁입찰이란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과당경쟁을 막고 중소기업
이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경제력집중문제가 제기됐거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한 중소기업형
공기업에 대해 이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게 기획원의 입장이다. 이런
보완대책을 통해 민영화방식에 대한 잡음을 해소함으로써 민영화작업을
보다 과감히 밀어붙이자는 의도로 해석할수 있다.
예컨대 한국중공업 가스공사등 덩치큰 공기업에 대해서만 업종전문화정책
과 출자총액제한 여신관리규정등을 감안해 제한입찰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민영화정책을
둘러싼 시비를 잠재울수 있다는게 기획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인있는 경영 <>경쟁입찰 등 민영화의 대원칙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특혜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게
문제다. 기획원이 당초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위해 내건
공개경쟁입찰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원이 제한경쟁입찰이란 특혜시비에 휘말릴지도 모를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과열인수경쟁이 빚어지면서 부터다.
민영화시기와 경제력집중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된
것도 민영화궤도수정을 부채질했다. "5대 그룹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획원이 제한경쟁입찰이란 특별매각방식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도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수
있다.
기획원은 이를위해 공기업민영화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별 투자기관법의
개폐를 검토하기도 했다. 특별매각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우선적인 검토대상에 올랐던 특별법 제정의 경우 기획원이 특혜시비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안으로 선호됐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독일등 외국에선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할때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는게
기획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구태여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방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영화를
추진중인 공기업이 주로 제조업이나금융기관으로 공공성이 비교적 적은
기업이라는 점도 감안됐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특별법과
같은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볼수 있다.
개별 투자기관법을 폐지할때 제한경쟁입찰을 명시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국민은행을 민영화하려면 국민은행법 폐지안을 마련해야하는데
여기에 이 규정을 넣자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는 법개정과정에서
더 큰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보완대책의 발표를 계기로 공기업민영화는 제2라운드에 접어
들었으나 민영화시기 대상기업선정 경제력집중등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포토] KEIT, 韓美 국제공동 R&D 본격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68668.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美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A.37133868.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