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지재권 보호로 또 대립..미국, 우선협상국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면으로 맞닥뜨렸던 미.중 두나라가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스페셜301조를 발동, 중국을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 이문제를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와관련, "미국제품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턴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무역보복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캔터 대표는 또 지적재산권보호여부는 무역관행의 투명성제고 노력등과
더불어 중국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에 대한 미국의 자세변화를
유도할수 있는 관건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적어도 6개월여 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협상을 벌인후 결실이 없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복조치는 범위의 제한없이 조사대상은 물론 모든 상품이나 분야에 대해
적용할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한다.
미국의 요구는 명확하다. 미국인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말고
복제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국제적으로 당연시되는 이러한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미국기업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레이저디스크(LD)
나 콤팩트디스크(CD),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테이프등을 불법복제한
상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D와 CD의 경우 중국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7개 대형 공장에서 연간 7천
5백만장이 무단복제되고 있다.
이중 중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은 5백만장에 불과하다.
그것도 장당 10원(1.72달러)이란 싼값에 판매된다.
우리돈으로 치면 장당 1천5백원정도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미국기업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는 연간
3억2천2백만달러에 달한다.
LD및 CD의 불법복제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손해액이 8억달러에 달한다는게
미국측 주장이다.
미국은 이에 더해 상표권침해도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는 자세이다.
중국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중국정부는 물론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중국내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온 노력들을 간과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최고 1백년동안에 걸쳐 점진적으로 취해왔던
지적재산권관련 보호조치들을 단 몇년새 취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게 센 구오팡 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달 5일 6개항의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적 영화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물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에도 모두 가입돼 있다.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그동안의 단속실적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8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3천5백5건의 관련분쟁이 법정에서 다뤄졌다.
92년과 93년 두해동안 7백31건의 상표위조범을 적발, 5백66명을 징역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구금이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중국국내의 상표등록이 급증, 지난해말까지 중국인이 등록한
35만건을 포함해 모두 41만건의 상표가 등록됐다.
특히 미국기업들의 상표등록은 지난 79년에는 1백2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6천2백2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할만큼 했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스페셜301조를
발동, 중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란 주장
이다.
"중국측으로서는 맞대응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몫이다"란 경고를 센 대변인은 빠뜨리지 않는등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사태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일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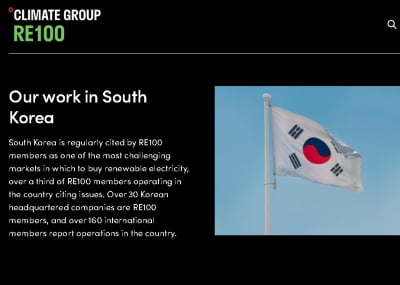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68235.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美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A.37133868.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