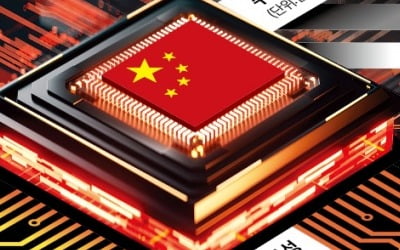올 증자 늦을수록 좋았다..전액 시가발행으로 희비 교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제일은행을 마지막으로 올 시중은행의 증자가 마무리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상당 정도의 실탄을 보충할수 있게돼 영업에 활기를
띠게 됐다.
그러나 증자를 한 은행들이 모두 희색인건 아니다. 액면가는 같더라도
증자시기에따라 납입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올 유상증자의 특징은 늦게 할수록 납입액이 많아 졌다는 점.
상업은행을 제외한 4개 시중은행의 경우 올 증자금액(액면가기준)은 각각
1천7백억원(3천4백만주)이었다. 그러나 실제 증자금액은 상당히 달랐다.
주당 발행가격이 9천8백원으로 결정된 제일은행이 3천3백32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신탁은행(1천9백38억원)의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액면가기준 2천억원을 증자한 상업은행의 2천2백80억원을
웃돌고 있다.
선두다툼이 치열한 조흥은행(2천4백48억원)이나 한일은행(2천5백16억원)
보다도 월등히 많다.
이같은 차이는 발행주식이 전액 싯가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주배정일의 주가가 높을수록 주당 발행가격도 높아진다.
상반기만해도 주당 1만원을 밑돌던 은행주는 하반기들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가장 늦게 증자를 한 제일은행의 주당 발행가격은
9천8백원에
달했다.
반면 <>한일 7천4백원 <>조흥 7천2백원 <>상업.서울신탁 각각 5천7백원
에 그쳤다. 지금까지는 증자를 먼저하는 은행이 유리했었다.
올들어 이같은 통설은 바뀌었다.
증시의 등락이 초래한 이례적 현상이 은행영업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
이에따라 은행들은 상당 정도의 실탄을 보충할수 있게돼 영업에 활기를
띠게 됐다.
그러나 증자를 한 은행들이 모두 희색인건 아니다. 액면가는 같더라도
증자시기에따라 납입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올 유상증자의 특징은 늦게 할수록 납입액이 많아 졌다는 점.
상업은행을 제외한 4개 시중은행의 경우 올 증자금액(액면가기준)은 각각
1천7백억원(3천4백만주)이었다. 그러나 실제 증자금액은 상당히 달랐다.
주당 발행가격이 9천8백원으로 결정된 제일은행이 3천3백32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신탁은행(1천9백38억원)의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액면가기준 2천억원을 증자한 상업은행의 2천2백80억원을
웃돌고 있다.
선두다툼이 치열한 조흥은행(2천4백48억원)이나 한일은행(2천5백16억원)
보다도 월등히 많다.
이같은 차이는 발행주식이 전액 싯가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주배정일의 주가가 높을수록 주당 발행가격도 높아진다.
상반기만해도 주당 1만원을 밑돌던 은행주는 하반기들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가장 늦게 증자를 한 제일은행의 주당 발행가격은
9천8백원에
달했다.
반면 <>한일 7천4백원 <>조흥 7천2백원 <>상업.서울신탁 각각 5천7백원
에 그쳤다. 지금까지는 증자를 먼저하는 은행이 유리했었다.
올들어 이같은 통설은 바뀌었다.
증시의 등락이 초래한 이례적 현상이 은행영업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