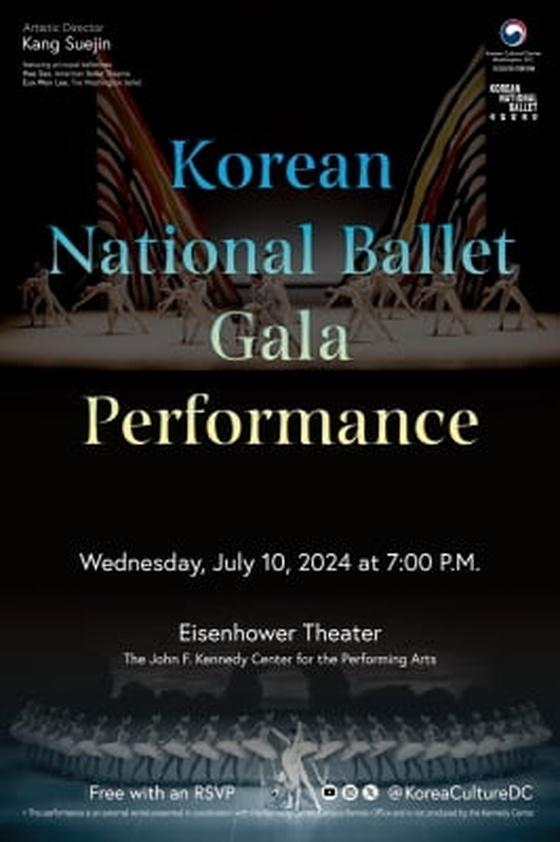[이슈진단] 남북통일 경제학 (2)..박제훈 <인천대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상의 이행기경제 체제전환 비교모델과 유형론을 북한경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적 개념 도입에 의한 모델의 확장이 요구된다.
즉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은 남북경제통합 또는 통일과 밀접한 연관하에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과 통합
(integration) 또는 통일(unification)간에 상호명확한 개념구분이 필요
하다.
우선 체제전환과 통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체제전환은 크게 정치체제의 전환과 경제체제의 전환으로 나눌수 있다.
정치체제의 전환은 탈공산주의 민주정권 수립을 의미하며 경제체제전환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제도구축과 정책의 집행및 이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의미한다.
정치체제의 통일은 통일정부의 수립을, 경제체제의 통일은 단일시장체제의
형성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체제전환을 체제내의 개혁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혁도 정치와 경제 양부문에 있어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1단계 개혁과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인 2단계 개혁으로 각각 나눌수 있다.
북한의 현단계는 김일성 사망으로 개혁 1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볼수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등장을 체제전환의 시발점으로 볼때 현시점에서
의 북한체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체제도 중.장기적으로 여타 이행기경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가 갖고 있는 초기조건및 이념상으로 여타 이행기경제와
상이한 특수성에 의해 체제전환 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아직까지 기존의 주체사상을 대체할, 또한 보완할 나름의
개혁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조건에 있어 북한은 여타 이행기경제의 경우보다 어려운 여건이라고
불수 있다.
우선 김일성이 사망하기는 했지만 권력이 그의 아들 김정일에 의해 물려짐
으로써 여타 사회주의국가에서 있었던 독재자 사망이후 나타났던 격하운동과
그에 따른 체제개혁 움직임이 북한에서는 어렵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면에서의 초기조건은 1978년의 중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공업화단계가 높고 농업 비중이 적은 상태라는 점과 북한체제가 훨씬
고립되어 왔다는 점에서 찾을수 있다.
이 점에서 농업부문에서의 개혁과 해안지역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이라는
중국식 개혁모델의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은 매우 회의적이다.
한편 구동독과 달리 북한은 체제전환을 담당할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두 단계는 더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
모델과도 상이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경영자의 삶은 책임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108314.3.jpg)
![[다산칼럼] 일본 주식시장 부활의 교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4201783.3.jpg)
![[차장 칼럼] 고급두뇌·투자 이민 받을 준비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3416345.3.jpg)


![뉴욕증시, PCE 대기하며 강보합...네이버웹툰 10%↑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28062256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