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관료] (56) 제5편 신패러다임을 (5) 정고관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벽녘까지 야근을 하고 난 경제기획원 예산실 B과장이 그만 잠에
떨어졌다.
국회 예결위 기사대기실에서. 아침 8시께 이경식경제부총리(당시)가
비서실장과 함께 이 곳에 나타났다.
비서실장은 B과장을 흔들어 깨웠다.
부총리도 이 곳에서 눈좀 붙이게 할 요량에서였다.
여기서 해프닝이 빚어졌다.
"부총리고 뭐고 난 모르겠다".
B과장은 잠결에 이렇게 내뱉고 말았다.
부총리일행은 대기실을 슬며시 빠져나갔다.
잠결에서도 뭔가 꺼림칙하다고 느꼈던지 B과장은 이내 정신을 차린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따라나간다.
부총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B과장은 아차싶어 "죄송합니다"고 말한다.
부총리의 대답은 "됐다. 더 자거라".
일국의 부총리와 실무과장이 쪽잠이라도 자 보겠다고 국회 기사대기실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는 모습.
지나친 비유인지는 몰라도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파워구도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삽화다.
삽화의 제목은 물론 "정고관저".
정고의 파고는 예산 편성때 특히 높게 일어난다.
그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는 "예산장관"(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고대책마련에서도 알 수 있다.
대책중의 하나가 건강진단이다.
파고를 타기 위한 체력점검이라고나 할까.
최근 신병때문에 물러난 정재석전부총리가 "대장 종양"이란 병을 확인한
것도 이 "예산 건강진단"에서였다.
매년 10월 1일이면 정부는 국회에 다음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정부가 "여의도"에 보낸 내년도 예산안 설명서및 부속자료는
2.5t트럭 4대분이었다.
1만원짜리를 이만큼 실으면 내년 예산안 규모인 54조9천억원이 된다고
한다.
행정부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전처럼 모시는 일은 조금도 이상할게
없다.
문제는 상전의 논리가 엉뚱하다는데 있다.
의원들은 우선 큰소리를 쳐놓고 보는데 익숙하다.
큰 소리가 날 때마다 "관저"쪽인 관료들은 쩔쩔맨다.
"처분"만을 기다린다.
그래서 관의 예산논리는 정의 지역구논리에 완패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과천의 입장에서 보면 애써 짜놓은 예산운용계획이 마구 헝클어지고
무너지기 일쑤다.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보자.
지난해 11월 막바지 계수조정회의에서였다.
민주당 박모의원은 광주 평동과 천안에 추진하고 있던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 왜 예산배정이 안돼 있느냐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 때 이부총리(당시)는 단상에 15차례나 불려나갔다.
"발언도중 말을 중단당한 것은 아흔아홉번이나 됐다"(기획원 K과장).
기획원은 그만 손을 들어버리고 만다.
예산안을 다시 조정해서 얼마큼을 박의원의 "관심사항"인 전용공단에
배정해야 했다.
다른 쪽의 예산이 그만큼 삭감된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치권이 편입할 것을 요구해 새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이 많다.
적어도 20-30개는 된다.
이는 수백개의 사업예산이 만들어진 5,6공때 보다는 크게 나아진 것이다.
아무려나 "누더기 예산"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과천에선 뒤바뀐 예산배정 내역에 대해서도 재빠르게 논리까지
만들어줘야 한다.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있는 관료"라는 우스갯말까지 나온다.
물론 예산엔 정치논리가 끼어들 수 있다.
"예산은 그 해 국가운영계획을 계량화한 것이다. 경제논리로만 짤 수는
없다. 정치논리가 끼어드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행정부처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병일 국민생활국장)는
얘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논리건 경제논리건 어느 것이 장래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점인데 그걸 따지기가 힘들게시리 돼있다는 점이다.
정은 높고 관은 낮으니 말이다.
문제는 정고관저현상이 왜 예산편성때 기승을 더하느냐는 것이다.
답의 하나는 현재의 우리 예산배정방식과 구조가 잘못돼 있다는 것.
단적인게 보조금이나 교부금같은 제도다.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해 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힘없는" 지자체는 지역국회의원의 힘을 빌어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대부분의 세금은 지자체가 거둬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모조리 중앙정부가 빨아들인다.
그리고는 생색을 내며 "적선하듯" 얼마간을 도로 지방에 나눠준다.
걷는 쪽 다르고 나눠주는 쪽 다른 "따로 국밥"인 셈이다.
"따로국밥(예산)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보면 그릇된 정고관저를 시정하는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방이 쓸 것은 지방이 거두어서" 쓰게 하면 된다.
여기에는 집행결과를 챙기는 검증시스템의 도입도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렇게만 되면 예산국회때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원들의 큰 소리가 적어질
게다.
혼쭐만 나는 관료들도 "쪽잠 다툼"에서 해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리=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구축함 만들겠다"…美 급한 불 떨어지자 벌어진 깜짝 결과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5604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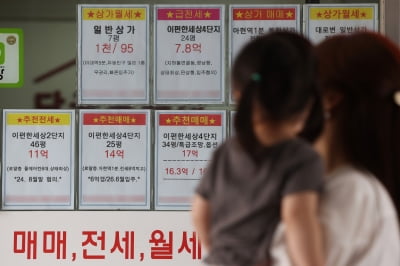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