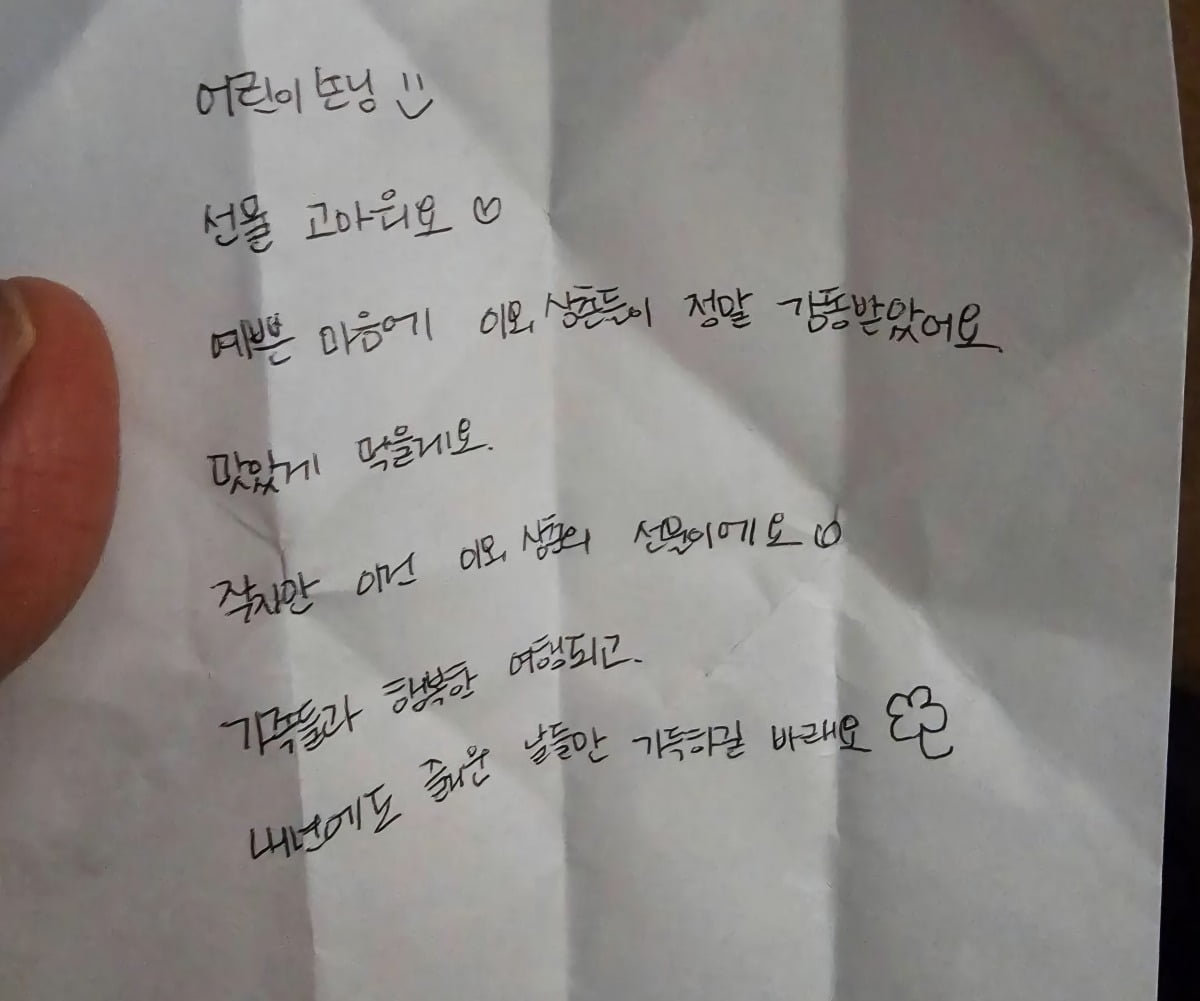이쪽 얘기를 듣고있지 않았다는 뜻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수호조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나라에는 없는 생소한
것이라는 뜻이오"
"쇄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국제간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호조약을 체결한다고 서두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귀국은 서양 나라들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귀국과 우리 나라는 과거 근
삼백년간 친선을 도모해 왔잖아아요. 앞으로도 그 관례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무슨 조약이 필요하오"
"그렇다면 왜 지난 팔년 동안 국서를 접수하지 않았나요?"
"그건 서식이 관례에서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오. 종전의 서식대로 정정해서
제출하라는데, 끝내 귀국측에서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오"
결국 강화도에서 정식 회담도 지금까지 동래부에서 밀고 당기고 했던 그
논쟁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쇄국을 개국으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은 조선국에 대하여 일본국측에서
종래와 다른, 근대적인 조약에 의한 정식 개국을 요구하는 터이니, 그렇게
돌 수 밖에 없었다.
오늘은 부드럽게 나가 자기가 일을 매듭지어 보려던 이노우에의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날도 서로 갑론을박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결론 없이
회담은 끝났다.
그리고 이튿날 삼차 회담이 열렸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다가
긴장될대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구로다가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듯
신헌에게 들이됐다.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기 바라오. 수호조약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소,
없소? 없다면 우리는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소"
그말은 곧 무력 행사로 들어가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신헌은 잠시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번쩍 눈을
뜨고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전권대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장
이자리에서 내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소. 우리의 조정에 문의를 해서
지시를 기다려 답할 것이오"
"좋소. 그렇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회답이 있길 바라오"
일단 그렇게 회담은 휴회로 들어갔다.
곧 수호조약에 대하여 문의하는 장계를 한양의 조정으로 보냈고, 그것을
접수한 조정에서는 중신들이 모여 앉아 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


![[토요칼럼] 동네 체육센터의 1초컷 신청 마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6897407.3.jpg)

![[취재수첩] 재난 앞에 '오락가락' 국토부, 철저한 조사로 불안 없애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28440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