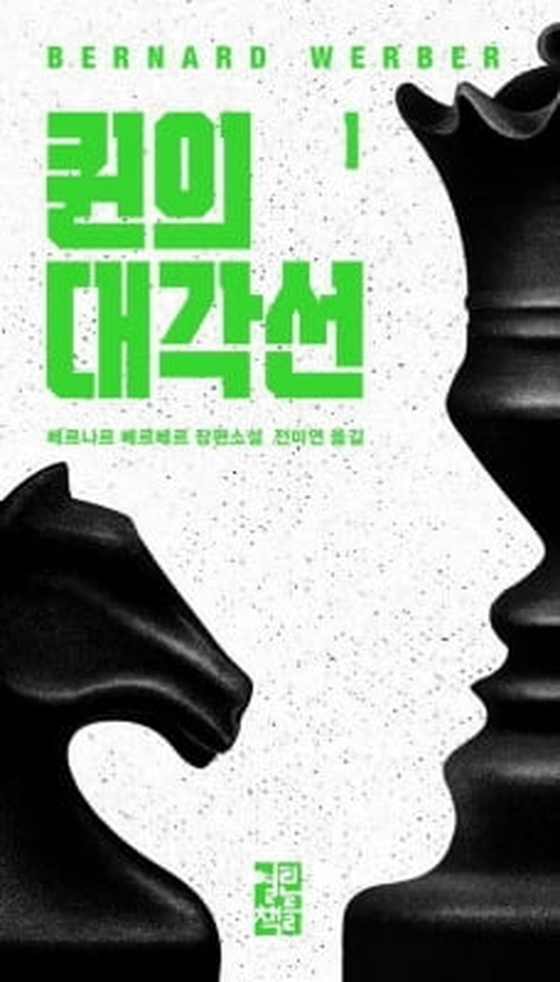대기업 병원사업 '너도나도'..이미지개선/기밀보호등 잇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종합병원을 세운데 이어 LG그룹까지 병원사업에 가세키로 하면서
생겨나는 의문이다.
이들 대기업이 병원사업에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삼성의료원 2001호.20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방이다.
프레지던트 존(President Zone)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은 지난해 개원이후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건희회장이 개원식때를 빼놓고는 그동안 이병원에 들리지 않은 탓이다.
이회장의 개인 병실인 이곳에는 입원실은 물론 응접실 수행원실 진단실등
모든 기능이 갖춰져있다.
서울중앙병원도 마찬가지.정주영명예회장의 개인병실이 마련돼 있어 자주
정명예회장의 건강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의 건강은 해당기업 최고의 기밀사항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총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기업그룹 총수들이 병원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이다.
병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만큼 마음만 있으면 발을 담그기도 쉽다.
과거 고 이병철삼성그룹회장은 고려병원에서만 건강진단을 받았다.
이병원에서 뇌수술도 받았고 위암진단도 이병원에서 내렸다.
위암진단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이병철회장의 건강이력은
고려병원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건희회장이 자산가치 2백억원의 고려병원을 5백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되사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대기업들이 21세기를 겨냥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공학
신약개발등의 사업에도 병원은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다.
각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도도
퇴색시킬 필요는 없다.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지난해 사회사업에 1천억원이상씩을 들인 것이
좋은 사례이다.
사회와 공존해야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이 그룹에 사회봉사단을 만든 것과 같이 "돈"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봉사에 나서는 바람직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미지 개선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밀보호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두가지 메리트는 앞으로 "재계병원"을
계속 늘려나갈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김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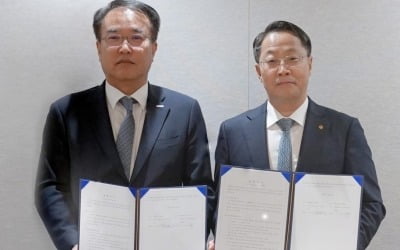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