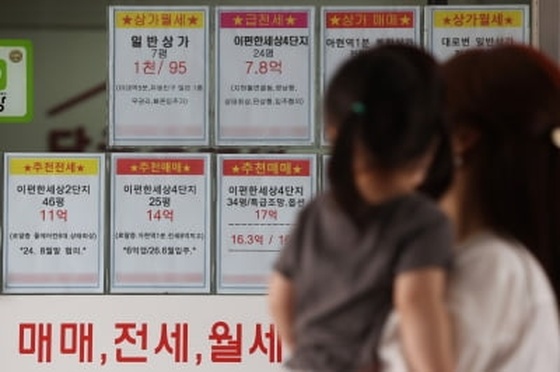[천자칼럼] 불신받는 공무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 향기에 취해 버렸다.
그때 그의 뇌리에 제일먼저 떠오른 사람이 임금이었다.
임금에게 미나리를 바쳐 별미를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또 어느 가난한 백성은 삼동취위에 떨다가 봄볕을 등에 쬐어 보고는
뛸듯이 기뻐하며 "이 좋은 방법을 임금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한다.
"미나리와 햇볕"(근 일 의 )이라는 이 고사는 조선왕조때 신하들이
임금을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을 글이나 말로 나타낼때 즐겨쓰던
표현이다.
"애오라지 미나리와 햇볕을 바치는 정성을 본받아."하는 식으로
말이다.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출범했던 조선왕조의 정치이념은 "인정"과
"애민"이었다.
김시습 같은 이는 "국자민지국"(나라는 민의 나라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국초에는 애민의 정치를 어느정도 실현한듯 보이지만 15세기
후반에 오면 권력의 부패와 문란으로 "인정"이니 "애민"이니 하는 말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백성들은 수취의 대상이 되고 그 일은 중앙의 관리,방백 수령 향사가
도맡았다.
관존민비의 뿌리깊은 악습도 이때부터 생겼다.
백성들은 관리를 "사모쓴 도둑"으로 여겨 경멸의 뜻을 지닌 "벼슬아치"
라고 불렀다.
악질 향리를 가리키는 "원악향사"라는 말도 나왔고 급기야는 소사망국론"
이 등장 하기에 이른다.
망국의 고통을 겪은뒤 민주주의를 표방한 근대국가를 세우고 나서도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상은 여전히 좋은축에 들수는 없었다.
"후진국의 관리와 오뉴월의 생선은 썩기 쉽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로 계속 지탄을 받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진것 같아보이지 않는다.
"세도"사건등 대규모의 공무원비리가 계속 터져나와 "벼슬아치"에 대한
불신은 한층 악화된 듯한 느낌마져준다.
최근 한국사회학회가 서울시민 800여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인데 반해
98.1%가 존경을 받지못한다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니 앞으로의 일이
걱정스럽다.
오늘날 국가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국민이다.
공무원이 애오라지 미나리와 햇볕을 바치는 지극한 정성을 국민에게
기울일때 "공복"이라는 의미도 되살릴수 있고 신뢰도도 그만큼 높일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특별기고] 중앙은행 뒤를 이을 타자가 필요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198392.3.jpg)
![[천자칼럼] 전랑외교관 싱하이밍의 퇴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198353.3.jpg)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