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기업] 미국 '리복' .. 신발생산기지 아시아 전역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차지하기 위해 "아시아 탐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한 켤레의 신발도 생산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등 아시아 전역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리복이 아시아 탐험에 나선 것은 한국과 대만에서 임금이 너무
올라 종전대로는 더이상 버티기 힘든 탓이었다.
리복의 양대 "군수기지"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에서는 이제 스포츠슈즈
판매량의 9%가량만이 생산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한군데인 대만의 신발제조공장은 지난해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대신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1억7,000만켤레의 신발을 생산, 리복이
판매하는 스포츠슈즈의 60%를 두나라에서 조달받고 있다.
리복이 이처럼 임금수준에 집착하는 것은 신발제조산업의 특성상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때문이다.
미운동화협회(AFA)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내 상점에서 켤레당 70달러정도에
팔리는 스포츠용 신발을 동아시아지역에서 만들 경우 리복사수준의 회사는
제조단가만 20달러정도 먹힌다.
그러나 운영비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신발회사에 돌아가는 순익은
켤레당 6달러정도에 불과하다.
제품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리복의 마진폭이 이처럼 낮은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복의 제품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이나 소재는 모두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
그에 따라 단가는 상당히 많이 먹힐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올 가을께 선보일 고급 농구화제품인 리복의 가미가제의 초경량
밑바닥 쿠션재질등은 미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소재나 반제품등은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으로 보내져 마무리되게 된다.
상품의 품질 수준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는 탓에 이같은 전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리복이 해외에 공장을 짓게 되면 처음부터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조깅화나 에어로빅화등 저가품을 생산토록해 기술이 웬만큼 축적
됐다고 판단돼야 고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87년에 현지에서 신발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몇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발을 처음부터 생산할수 있도록 조치
했다.
이는 중국의 임금이 다른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이점이 있는데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상당히 갖춰졌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그 결과 리복의 10여개 중국 공장은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으며 이 가운데는 월간 75만켤레의 신발을 생산해내 리복의 연간 매출액이
33억달러에 이르도록 하는데 한 몫을 하는 곳도 있다.
리복은 자체로 마련한 6가지 기준에 따라 해외공장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소매상으로부터 하자있는 제품의 반품량이 어느정도이며 납기를
얼마나 제대로 맞추는가 하는 채점기준이 포함된다.
특이한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기준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현지공장들은 적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아이들을 고용하거나 강제노역을 시켜서도 안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원가절감이 중요하다고 해도 비도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는 방침인 것이다.
리복은 올초부터는 베트남에서 신발생산을 시작했다.
유럽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또 성장가능성이 엄청난 시장에 경쟁업체들
보다 한발 앞서 진출한 셈이다.
< 김현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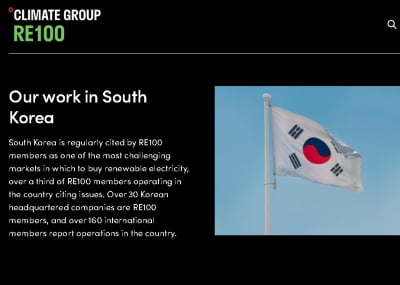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68235.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美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A.37133868.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