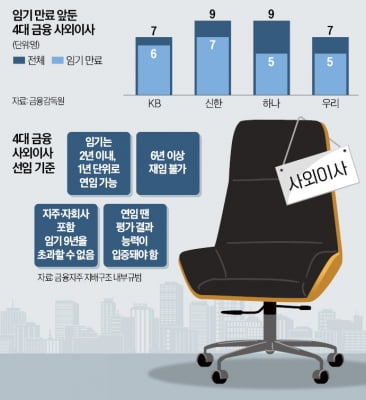팽배하다.
효산 유원건설에 이어 우성건설부도까지 휩쓸렸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우성건설은 어차피 그리 오래가지 못할 기업이었다.
한계에 다다른 기업의 수명을 연장해주는건 주거래은행의 몫이다.
제일은행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수 밖에 없고 그러면 부실채권의
규모도 늘어날게 뻔하다.
제일은행은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성공"했다.
만일 탄탄한 인수기업이 빨리 찾아진다면 우성건설에 대한 여신
(2천3백21억원)도 온전히 회수할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절대 "실"만은 아니다.
제일은행은 이번 우성사태를 경영호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우성건설의 부도로 은행발전을 가로막는 대형부도에 휩쓸릴 소지가
사라졌다.
금융사고등만 방지하면 얼마든지 경영정상화를 꾀할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수지호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방이동체육관을 매각하고 야구부등 운동부를 해체한데 이어
올해안에 광복동출장소건물과 창동축구장 식사리야구장을 매각할 예정이다.
또 60건의 비업무용부동산(5백88억원상당)을 조속히 매각하고 5개 지점을
추가로 출장소로 격하시키며 본점건물 3개층을 임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5개 점포의 여유면적을 임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줄잡아 1천억원이상이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제일은행의 판단이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우성건설이 제3자에게 인수되면 제일은행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현재로서는 자구의무를 부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제일은행이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듯 하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