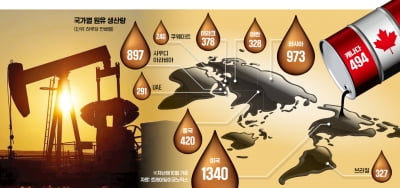11월28일은 철강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날로 기록돼 있다.
''꿈의 제철법''으로 불리는 용융환원제철법(코렉스)을 사실상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세계가 포철 코렉스로의 성공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 철강업체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제철기술엔 용융환원
제철법 외에도 박슬래브공법 스트립캐스팅 등이 있다.
모두가 기존의 고로법에 비해 환경공해가 적고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고로를 대체할 이들 혁신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업체들도 이 대열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혁신기술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차세대 혁신기술중 현재 가장 먼저 상용화된 것은 박슬래브공법.
말 그대로 얇은 슬래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존의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브는 보통 두께가 250mm정도.
그러나 박슬래브 공법에선 두께 50mm의 슬래브를 만들어 낸다.
이것을 압연해 바로 핫코일을 제작하므로 기존의 열연설비보다 공정이
50%정도까지 줄어든다.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든다.
또 하나 특징은 박슬래브 설비는 전기로의 쇳물를 사용한다는 점.
고철을 원료로 한 전기로에 이용되므로 철광석을 쓰는 고로에 비해 역시
투자비와 비용이 적다.
철광석 소결공정이 필요없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다는 것도 장점중
하나다.
물론 이는 역으로 따지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철광석이 아닌 고철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보철강이 작년 6월 당진에 연산 200만t규모의 박슬래브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국내에선 처음이다.
한보의 박슬래브공법 도입은 포철의 "핫코일 독점공급 체제"를 무너뜨렸다
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박슬래브의 경우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10기정도만 설치돼 가동중이다.
그러나 오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40~50기가 돌아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포철도 광양제철소에서 총 5,944억원을 투자해 올연말 준공 예정으로 연산
180만t규모의 박슬래브 열연설비를 건설중이다.
박슬래브 다음으로 업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기술은 용융환원
제철법.
철광석과 석탄을 예비처리하지 않고 바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로방식에 비해 "첨단"으로 통한다.
현재의 고로방식은 용광로에 철광석과 유연탄을 넣기 전에 각각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을 거쳐 1차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용융환원제철법은 이를 생략한다.
그만큼 투자비가 줄고 동시에 환경오염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용융환원제철법은 다시 코렉스법 다이오스법 직접제철법등으로 세분된다.
이는 철광석을 어떻게 처리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포철이 준공해 가동중인 코렉스 공장은 철광석을 조제제와 함께 예비
환원로에서 일단 한번 처리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선 완전한 용융환원제철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국내 철광업계는 철광석 분광을 아무런 처리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완벽한 용융환원제철법을 공동 개발중이다.
이밖에 다이오스법과 직접제철법은 각각 일본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방법이다.
코렉스 설비의 경우 지난 89년말 오스트리아 페스트알피네사가 처음으로
개발했다.
현재 남아공의 이스코르사가 연산 30만t의 설비를 시험용으로 가동중이기도
하다.
한보철강은 당진제철소 2단계 공사로 연산 80만t규모의 코렉스 2기를
건설중이다.
이 설비는 금년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혁신기술은 스트립 캐스팅이다.
슬래브 주조를 거치지 않고 고로에서 나온 쇳물로 막바로 핫코일을 만드는
기술이다.
제강공정과 압연공정이 통합되는 셈이다.
기존의 핫코일 압연라인이 600~1,000m에 달하는 반면 스트립 캐스팅을
이용하면 라인이 60m밖에 안된다.
또 투자비도 30~40%로 준다.
물론 아직 국내엔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데이비사와 협력해 52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개발중이다.
오는 98년에 실용화시키는게 목표다.
이 기술은 신일철이 지난 89년 폭 800mm짜리 스테인리스 강판 주조법을
개발하는등 가장 앞서 있다.
미국 알코사도 폭 1,220m짜리 스테인리스 강판을 만들 수 있는 상업설비를
개발중이다.
물론 이들 혁신기술이 기존의 고로법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슬래브 공법의 경우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높지만 제품 순도가 떨어져
고급강판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용융환원제철법은 규모의 경제성에서 아직 고로법에 크게 뒤진다.
포철의 신제선공장만 해도 연산 60만t에 불과하다.
연간 300만t이상의 쇳물을 쏟아내는 고로와는 비교가 안된다.
그러나 21세기 세계 철강업계의 판도는 이들 혁신기술의 보유 여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미국 일본등 선진 각국은 이미 박슬래브 코렉스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철강산업이 "제2의 신화"를 만들수 있느냐, 없느냐는 혁신기술의
성공적 도입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


![[한경에세이] Why에 대한 공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718266.3.jpg)
![[기고] 위기의 中企…디지털·AI로 돌파구 모색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9323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