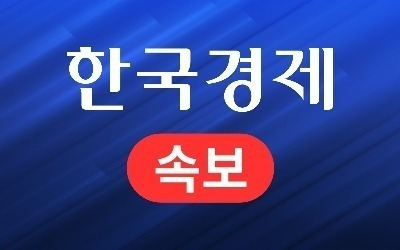[세계경제 포커스] 아르헨티나 '인플레킬러' 카발로장관해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미 경제개혁의 기수인 도밍고 카발로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26일 카발로 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로케 페르난데스 중앙은행총재를 임명했다.
카발로의 해임소식은 아르헨티나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선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으나 국제금융계에선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
브라질 등 이웃 남미국가의 증시가 이 소식하나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는가 하면 외환시장에서도 동요가 일고있다.
성마른 일부 민간경제분석가들은 "제2의 멕시코 페소화사태"를 우려할
정도다.
90년대 남미경제에서 카발로 장관의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카발로 장관의 해임은 경제정책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메넴 대통령과
불화를 빚었기 때문이라는게 관측통들의 해석이다.
그는 실제로 지난 24일 태통령 집무실에서 메넴 대통령과 고성이 밖에서
들릴 정도로 한바탕 설전을 벌인뒤 강력한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사람간에는 최근 공무원감원과 금리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불화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그간 어렵사리 다져온 안정성장기조를 해치지 않기위해 공무원수를 계속
줄여야 하고 통화고삐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카발로 장관을 보면서
메넴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인물로 본 것이다.
카발로 장관은 지난 91년 메넴 대통령의 취임후 곧바로 입각,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갔다.
이른바 "카발로플랜"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미달러화에 대해 1대1로 묶어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와 임금간 연동제도 폐지했다.
또 공기업들을 과감히 민영화시키고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경제
자유화조치도 단행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개혁조치가 결실을 거둬 80년대에 연평균 2,000%대에 이르던 물가
상승률이 한자릿수로 주저앉았고,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7%선으로
증가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아르헨티나는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세계 3위의
고성장국가로 오르기도 했다.
하루 사이에 세번이나 물가인상발표가 나올 정도로 만성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가 "저물가, 고성장 국가"로 일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발로 장관에겐 "인플레이션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출신인 그는 또 "이론을 성공적으로 현실에 접목시킨
인물"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지난 3월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카발로 장관 재임기간중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최근 10년사이에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성공작"
이라고까지 극찬했다.
카발로의 경제개혁이 휘청거리던 때도 없진 않았다.
지난 94년12월 멕시코 페소화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르헨티나로 그 불똥이
튀어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산업생산은 급격히 위축됐다.
이 여파로 아르헨티나는 95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4.4%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영웅은 난세를 타듯, 이같은 위기상황이 카발로의 진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메넴 대통령은 물론 야당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촉구할 때 카발로 장관은 "일시적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면서 일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금융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외부의 불안한
시각을 불식시키는데만 주력할 뿐 안으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긴급구제의
목소리를 그는 애써 외면했다.
카발로 장관이 메넴 대통령의 눈밖에 밀려난 것은 이때부터다.
카발로 장관의 예견대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올들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다시 5%대의 안정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번 불거진 두사람간 불화의
씨앗은 꺼질줄을 몰랐다.
특히 카발로 개혁의 아킬레스건인 실업문제가 최근 아르헨티나의 핵심
정치.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메넴 대통령에게 재집권의 최대공헌자인
카발로 장관의 옷을 벗기도록 만든 것이다.
아르헨티나 야당은 메넴 집권이전 6%에 불과하던 실업률이 96년 5월말현재
18.3%로 높아진 것은 카발로의 경제개혁 때문이라면서 오는 8월1일 총파업
으로 이를 성토할 계획이다.
결국 카발로 장관의 사임은 이론적 대안이 절박한 현실을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극복하기 얼마나 힘드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박순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26일 카발로 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로케 페르난데스 중앙은행총재를 임명했다.
카발로의 해임소식은 아르헨티나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선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으나 국제금융계에선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
브라질 등 이웃 남미국가의 증시가 이 소식하나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는가 하면 외환시장에서도 동요가 일고있다.
성마른 일부 민간경제분석가들은 "제2의 멕시코 페소화사태"를 우려할
정도다.
90년대 남미경제에서 카발로 장관의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카발로 장관의 해임은 경제정책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메넴 대통령과
불화를 빚었기 때문이라는게 관측통들의 해석이다.
그는 실제로 지난 24일 태통령 집무실에서 메넴 대통령과 고성이 밖에서
들릴 정도로 한바탕 설전을 벌인뒤 강력한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사람간에는 최근 공무원감원과 금리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불화의 골이
깊어졌다고 한다.
그간 어렵사리 다져온 안정성장기조를 해치지 않기위해 공무원수를 계속
줄여야 하고 통화고삐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카발로 장관을 보면서
메넴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인물로 본 것이다.
카발로 장관은 지난 91년 메넴 대통령의 취임후 곧바로 입각,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갔다.
이른바 "카발로플랜"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미달러화에 대해 1대1로 묶어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와 임금간 연동제도 폐지했다.
또 공기업들을 과감히 민영화시키고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경제
자유화조치도 단행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개혁조치가 결실을 거둬 80년대에 연평균 2,000%대에 이르던 물가
상승률이 한자릿수로 주저앉았고, GDP(국내총생산)는 연평균 7%선으로
증가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아르헨티나는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세계 3위의
고성장국가로 오르기도 했다.
하루 사이에 세번이나 물가인상발표가 나올 정도로 만성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가 "저물가, 고성장 국가"로 일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발로 장관에겐 "인플레이션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출신인 그는 또 "이론을 성공적으로 현실에 접목시킨
인물"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지난 3월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카발로 장관 재임기간중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최근 10년사이에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성공작"
이라고까지 극찬했다.
카발로의 경제개혁이 휘청거리던 때도 없진 않았다.
지난 94년12월 멕시코 페소화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르헨티나로 그 불똥이
튀어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산업생산은 급격히 위축됐다.
이 여파로 아르헨티나는 95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4.4%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영웅은 난세를 타듯, 이같은 위기상황이 카발로의 진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메넴 대통령은 물론 야당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촉구할 때 카발로 장관은 "일시적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면서 일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금융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외부의 불안한
시각을 불식시키는데만 주력할 뿐 안으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긴급구제의
목소리를 그는 애써 외면했다.
카발로 장관이 메넴 대통령의 눈밖에 밀려난 것은 이때부터다.
카발로 장관의 예견대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올들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다시 5%대의 안정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번 불거진 두사람간 불화의
씨앗은 꺼질줄을 몰랐다.
특히 카발로 개혁의 아킬레스건인 실업문제가 최근 아르헨티나의 핵심
정치.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메넴 대통령에게 재집권의 최대공헌자인
카발로 장관의 옷을 벗기도록 만든 것이다.
아르헨티나 야당은 메넴 집권이전 6%에 불과하던 실업률이 96년 5월말현재
18.3%로 높아진 것은 카발로의 경제개혁 때문이라면서 오는 8월1일 총파업
으로 이를 성토할 계획이다.
결국 카발로 장관의 사임은 이론적 대안이 절박한 현실을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극복하기 얼마나 힘드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박순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