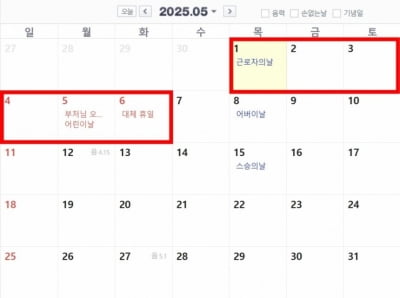[여성을 일터로] (25) 제4부 : 경제계 .. 고용기피 '역작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훈식 <경영자총협회 조사1부장>
자녀를 가지는 것은 가족내에서 가족 구성원을 재생산한다는 의미로
가정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다.
동시에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도 구성원의 재생산은 그 의미가 크다.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노동력의 충원은 바로 모성역할에서
비롯되며 국가 입장에서 국가 구성원의 재생산은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성보호비용을 개인이 아닌 기업 사회나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직장에서 우수한 노동력을
계속 붙잡아 놓고 싶을 때와 같이 일종의 소득 유인적 성격이 짙다.
그러나 모든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에 부담하라고 하면 여성을 채용할때의
노동비용이 남성을 고용할 때 보다 더높다.
따라서 오히려 여성의 취업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육아를 위한 아버지의 휴직제도를 강화하는
등 육아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소득보상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정부보조를 보는 시각에도 두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대 재생산활동을 보조해 준다는 복지개념의 시혜로
보는것이 그 첫번째고,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활동이
국가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두번째다.
최근에 와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논리는 두번째이다.
정부가 모성보호비용을 상당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의
자녀출산이 국가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다음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가 모성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비용을 전담하는것에도 무리가 있다.
개인 기업 정부 어느 한 부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책을 위해서 한 예를 들수있다.
여성정책에서 한발 앞서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임신 출산과 육아를
위한 각종 유급휴가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임금의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재원을
기반으로 기업이 대신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탁아소의 경우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의 유아원을 운영하고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여성고용확대에 시사점을 던져 줄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
자녀를 가지는 것은 가족내에서 가족 구성원을 재생산한다는 의미로
가정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다.
동시에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도 구성원의 재생산은 그 의미가 크다.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노동력의 충원은 바로 모성역할에서
비롯되며 국가 입장에서 국가 구성원의 재생산은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성보호비용을 개인이 아닌 기업 사회나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직장에서 우수한 노동력을
계속 붙잡아 놓고 싶을 때와 같이 일종의 소득 유인적 성격이 짙다.
그러나 모든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에 부담하라고 하면 여성을 채용할때의
노동비용이 남성을 고용할 때 보다 더높다.
따라서 오히려 여성의 취업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육아를 위한 아버지의 휴직제도를 강화하는
등 육아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소득보상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정부보조를 보는 시각에도 두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대 재생산활동을 보조해 준다는 복지개념의 시혜로
보는것이 그 첫번째고,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활동이
국가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두번째다.
최근에 와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논리는 두번째이다.
정부가 모성보호비용을 상당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의
자녀출산이 국가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다음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가 모성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비용을 전담하는것에도 무리가 있다.
개인 기업 정부 어느 한 부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책을 위해서 한 예를 들수있다.
여성정책에서 한발 앞서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임신 출산과 육아를
위한 각종 유급휴가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임금의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재원을
기반으로 기업이 대신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탁아소의 경우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의 유아원을 운영하고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여성고용확대에 시사점을 던져 줄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