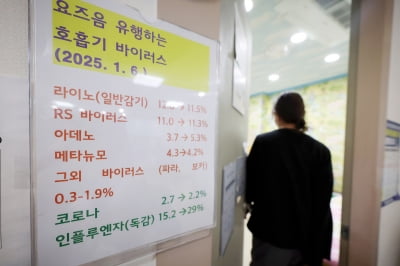3년여만에 다시 찾아온 불황국면을 맞아 대우그룹의 "세계경영"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불황을 견뎌내기 위해 명예퇴직이니 신규채용
동결이니 해가며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달리 대우그룹은 이렇다할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는 오히려 올해 수출목표를 늘려잡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등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사람이 모자란다며 이미 퇴직한 임원을 다시
불러들이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가 이처럼 불황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우사람들의 해답은 한결같다.
이제는 대우의 상징어처럼 돼버린 "세계경영"이 그 해답이다.
"세계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전지역,전품목이 불황을 겪는 일은 없다.
대우는 세계각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취급하는 품목도 자동차에서부터
섬유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지역이나 품목이 불경기라
해도 다른 지역, 품목에서 이를 충분히 커버한다"(강병호(주)대우사장)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과 품목의 다각화에 의한 "포트폴리오 경영"이 불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주)대우는 올해 수출목표를 당초 1백26억달러에서
1백31억달러로 상향조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유럽 CIS(독립국가연합)권
동남아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3억달러 <>기계.선박 1억달러
<>전기.전자제품 1억달러 씩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다른 종합상사들이 반도체가격하락이라는 악재 하나만으로도 수출목표를
내려잡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계경영"체제가 불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 회사의
인력운영 현황에서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대우에서는 최근 수년간 정기임원인사때 속된 표현으로 "잘린"임원이
거의 없다.
작년만해도 10명이 채안되는 임원이 회사를 나갔는데 이들도 대부분
자기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스카웃돼서 나간 자발적 퇴직이었다.
그 이유는 물론 해외사업장의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인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해외지사나 법인이 단순히 수출입업무만 다룬다면 부장급
이하 직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품개발-생산-판매가 모두 이루어지는 글로벌기업
단계에 이르면 해외사업장 책임자의 역할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막중해진다"(권오택상무.인사팀장)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대우의 해외주재 임원은 지난 91년 61명에서 지금은
1백83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5년만에 3배로 불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게 권상무의 설명이다.
대우의 경우는 임원을 자르기는 커녕 이미 퇴직한 임원까지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계림의 버스공장 인도의 DCM공장 동남아 동구 등에는 대우를
떠났던 임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임원급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도 대우는 각 계열사들이
올 하반기 대졸공채 규모를 작년보다 10%정도 늘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경영을 방패삼아 불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대우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세계 각지에 무리하게 사업장을 확장해나가다 보면 그중 한 곳에서의
사업부진이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그룹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력의 시각이다.
하지만 대우사람들은 지난 89-92년간 처절할 정도의 "관리혁명"을
시행했음을 상기시키며 이같은 우려마저도 일축한다.
"당시 우리의 목표는 경비를 50% 줄이던지 생산성을 50% 향상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슬림화 결재단계축소 계열사 정리계획 등이 그때
실행됐지요.
요즘 한창 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거품제거"를 일찌감치 손댄
셈입니다"(회장비서실 김윤식전무)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



![조선업 호황에 '잭팟' 노린다…"신제품 개발·해외 영업도 속도" [이미경의 옹기중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31355.3.jpg)

![[단독] "5년치 일감 쌓여"…미국서 '돈벼락' 맞은 한국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095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