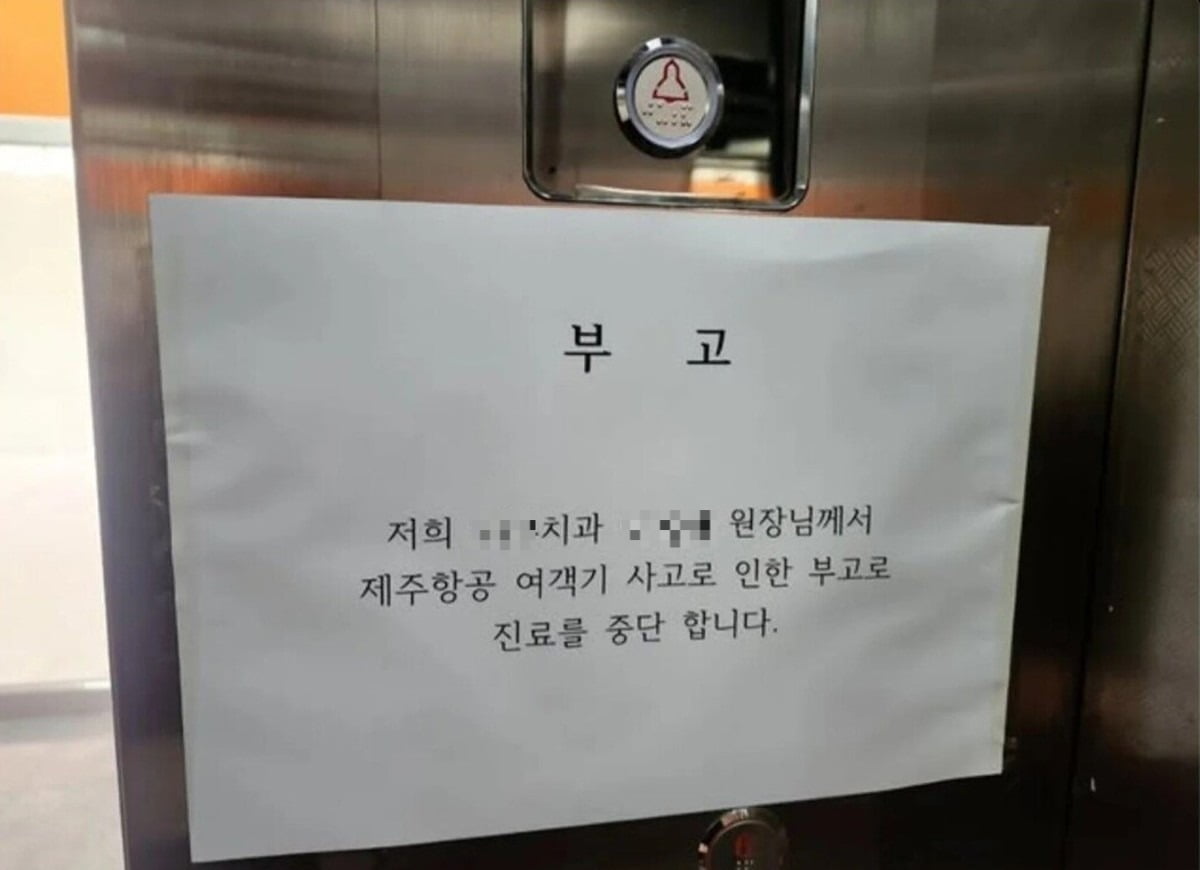이들 회장들에게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뿜어져 나온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로 "헝그리정신"이다.
이들 신흥그룹 회장들의 "입지전 스토리"를 듣노라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같다.
보릿고개의 배고픔으로 지샌 어린시절.
무작정 상경이후 밑바닥 생활을 전전해야했던 젊은날.
사업실패와 극적인 반전을 통해 사업가로서 우뚝 서게되기까지의 과정.
"취루성"이나"극적요소", 그 어느면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다.
혹독한 시련을 통해 연마된 집념이 있었기에 비교적 짧은기간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 회장들은 "되돌아 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시절이 없었다면
오늘날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평그룹 나승렬(53)회장의 최종학력은 "문평초등학교 졸업"이다.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헤어나기 위해 18세가 되던 62년 나회장은
무임승차로 상경길에 오른다.
그후 막노동 야채행상 식초장사등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어느정도 서울생활에 정착하자 그는 공인회계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리학원에 등록한다.
이때가 나회장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경리학원에 다니던 67년 나회장은 학원 추천으로 한국전자 경리과에
취업한다.
그후 탁월한 재무분석 실력으로 삼강산업(현 롯데삼강)의 경리과장으로
전격 스카우트된다.
여기서 그는 공개법인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재무제표를 보는 독특한
눈"을 키우게 된다.
이 재무실력을 밑천으로 나회장은 34세때인 78년,기업가로 변신한다.
그러나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모은돈을 거의 날려버렸다.
어떤 사업이라도 1백% 베팅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고 이듬해 재기에
도전하면서 설립한게 금성주택이었다.
거평그룹의 모체다.
실패로 단련된 나회장은 이때부터 승승장구했다.
나산그룹의 안병균(49)회장은 거평의 나회장과 많은 공통점을 지녔다.
안회장은 나회장의 고향과 산(국사봉)을 하나 사이에 둔 함평군
나산면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는점도 나회장과
다르지 않다.
안회장이 무일푼으로 상경을 결심한 것도 18세때였다.
안회장 역시 막노동꾼에서 영화엑스트라 식당 종업원까지 안해본 일이
없다.
첫 사업에 실패한 것도 닮은꼴이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 나회장과 안회장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농구팀 인수나 삼풍아파트 입찰때 거평도 관심이 많았지만 나산을
"밀어주기"로 결정하고 일절 나서지 않았을 정도다.
신원의 박성철(57)회장은 전라도 신안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생활속에서도 박회장은 우유배달 신문배달등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고등학교(목포고)를 졸업했다.
박회장은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상경을 결심한다.
서울에서 닥치는대로 잡일을 했지만 대학을 다니기는 무리였다.
그뒤 처가에서 운영하던 스웨터공장을 물려받으면서 박회장은 기업가로
변신한다.
과로로 쓰러져가면서도 3년간을 공장에서 숙식하며 버텨내 신원을 세계
최대의 스웨터 수출업체로 일군 것도 어려움속에서 단련된 집념 덕분이었다.
여기에 비하면 신호그룹의 이순국(54)회장은 엘리트다.
서울대 상학과까지 나온 인재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회장도 순탄하게 대학을 나온 것은 아니다.
가난으로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입사후에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불운을 겪었지만 이회장은 이를
그룹총수로 변신하는 계기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그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린다.
이랜드의 박성수(44)사장은 좀 별난 기업인이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나온 박사장은 여태껏 단 한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다.
기자들과 공식 인터뷰도 없었다.
"이랜드의 급성장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이다.
사장개인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게 박사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직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화장실 청소까지 직접 할 정도로
소탈하다.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총수이면서도 여전히 회장이 아닌
"사장"이란 직함을 고집하는 것도 박사장의 이런 성품 때문이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