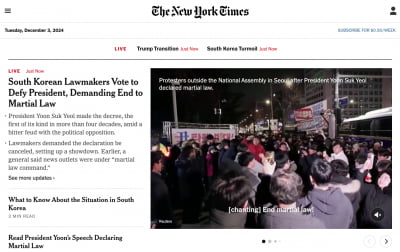[경영 신조류] '물러난 미국 재계 최고경영자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존 월터 AT&T사장이 지난 16일 사임했다.
전격 영입된지 8개월만이다.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회전문" 신세가 된 사람은 최근에 또 있다.
길버트 아멜리오 애플사 회장.
부실기업회생의 명수로 칭송되었지만 17개월만에 쫓겨났다.
90년대들어 "회전문"을 돌아나간 경영자들은 한둘이 아니다.
제법 이름난 사람만 꼽아도 마이클 오비츠 월트디즈니사장(14개월)
로버트 스템펠 GM사장(27개월) 로버트 프랑켄버그 노벨사장(30개월) 등이
포함된다.
미국 재계는 요즘 "회전문 경영자"가 이렇게 부쩍 늘어나는데 대해
반성중이다.
엄청난 임금(존 월터는 연봉 2천6백만달러, 오비츠 9천만달러, 아멜리오는
7백만달러등)을 주고도 일을 못해 물러나는 "실패사례"를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배경에서다.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 최고경영자선임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겠다는
다부진 결의다.
"회전문 경영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식시장의 가파른
상승세.
주가가 폭등하는 기업이 워낙 많아 주가움직임이 둔한 회사는 금방 눈에
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그런 회사들은 그냥 놔둘리
만무다.
투자기관인 렌스사의 로버트 몽크스사장은 "경영실적이 나쁘면 곧바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경영성적표인 주가가 떨어지면 최고경영자는
물러나는게 당연하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최고경영자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에 있다는게
재계의 분석이다.
능력없는 경영자를 선택한 것부터가 이사회의 잘못이라는 얘기다.
최근 AT&T와 애플의 이사회는 월터와 아멜리오를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지만 바로 얼마전 그들을 "경영의 귀재"로 칭송하며 임명한 것도
이사회였다는 데는 할말이 없다.
미국의 기업이사회는 대체로 최고경영자를 뽑는데 깊이 간여하지 않는다.
사장 선임에는 회장 개인의 입김이 세다.
월트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회장이 자기 맘대로 헐리우드의 일개
에이전트인 마이클 오비츠를 사장으로 임명했지만 14개월만에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다.
아이스너가 후계자를 고를때 이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이는
미국기업 대부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모색중이다.
급변하는 기술과 날로 복잡해져가는 자본시장, 기업의 세계화등에 대응할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탓이다.
해법은 이사회의 기능확대.
"투자가들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선출과정에 실질적으로 간여하길 희망
한다"(패트릭 맥건 기관투자가서비스사 부사장)는게 핵심이다.
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적 비젼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걸맞는 최고경영자
를 뽑아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 재계에선 이런 전형적인 모델로 IBM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93년 4월 루이스 거스너를 회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5명의 이사회 멤버는 회사의 장기전략을 우선 검토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 앤드류그로브 인텔회장등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회사의 문제가 전략부재에 있다는 것.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전문가보다는 경영전략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IBM출신은 아니지만 RJR내비스코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장을 역임하고
재계에서 신망받는 거스너는 그렇게 IBM에 입성했고 회사재건에 성공했다.
앞으로 미국 최고경영자 선임에 "IBM방식"이 크게 유행할 것임을 예측케
해주는 대목이다.
*** ''이상적인 이사회''상 ***
미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적인 이사회''상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직원퇴직 연금기금은 최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소개했다.
<>종업원을 겸하는 이사는 최고경영자(CEO)로 한정한다.
<>이사회 회장은 완전한 독립을 유지한다.
<>10년이상 근무한 이사는 독립성에 결함이 있다고 본다.
<>70세이상의 이사회 멤버는 전체의 10%이하로 한다.
이 모두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CEO에 대항하는 힘을 주기 위한
조치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
전격 영입된지 8개월만이다.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회전문" 신세가 된 사람은 최근에 또 있다.
길버트 아멜리오 애플사 회장.
부실기업회생의 명수로 칭송되었지만 17개월만에 쫓겨났다.
90년대들어 "회전문"을 돌아나간 경영자들은 한둘이 아니다.
제법 이름난 사람만 꼽아도 마이클 오비츠 월트디즈니사장(14개월)
로버트 스템펠 GM사장(27개월) 로버트 프랑켄버그 노벨사장(30개월) 등이
포함된다.
미국 재계는 요즘 "회전문 경영자"가 이렇게 부쩍 늘어나는데 대해
반성중이다.
엄청난 임금(존 월터는 연봉 2천6백만달러, 오비츠 9천만달러, 아멜리오는
7백만달러등)을 주고도 일을 못해 물러나는 "실패사례"를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배경에서다.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 최고경영자선임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겠다는
다부진 결의다.
"회전문 경영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식시장의 가파른
상승세.
주가가 폭등하는 기업이 워낙 많아 주가움직임이 둔한 회사는 금방 눈에
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그런 회사들은 그냥 놔둘리
만무다.
투자기관인 렌스사의 로버트 몽크스사장은 "경영실적이 나쁘면 곧바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경영성적표인 주가가 떨어지면 최고경영자는
물러나는게 당연하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최고경영자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에 있다는게
재계의 분석이다.
능력없는 경영자를 선택한 것부터가 이사회의 잘못이라는 얘기다.
최근 AT&T와 애플의 이사회는 월터와 아멜리오를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지만 바로 얼마전 그들을 "경영의 귀재"로 칭송하며 임명한 것도
이사회였다는 데는 할말이 없다.
미국의 기업이사회는 대체로 최고경영자를 뽑는데 깊이 간여하지 않는다.
사장 선임에는 회장 개인의 입김이 세다.
월트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회장이 자기 맘대로 헐리우드의 일개
에이전트인 마이클 오비츠를 사장으로 임명했지만 14개월만에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다.
아이스너가 후계자를 고를때 이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이는
미국기업 대부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모색중이다.
급변하는 기술과 날로 복잡해져가는 자본시장, 기업의 세계화등에 대응할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탓이다.
해법은 이사회의 기능확대.
"투자가들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선출과정에 실질적으로 간여하길 희망
한다"(패트릭 맥건 기관투자가서비스사 부사장)는게 핵심이다.
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적 비젼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걸맞는 최고경영자
를 뽑아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 재계에선 이런 전형적인 모델로 IBM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93년 4월 루이스 거스너를 회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5명의 이사회 멤버는 회사의 장기전략을 우선 검토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 앤드류그로브 인텔회장등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회사의 문제가 전략부재에 있다는 것.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전문가보다는 경영전략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IBM출신은 아니지만 RJR내비스코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장을 역임하고
재계에서 신망받는 거스너는 그렇게 IBM에 입성했고 회사재건에 성공했다.
앞으로 미국 최고경영자 선임에 "IBM방식"이 크게 유행할 것임을 예측케
해주는 대목이다.
*** ''이상적인 이사회''상 ***
미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적인 이사회''상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직원퇴직 연금기금은 최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소개했다.
<>종업원을 겸하는 이사는 최고경영자(CEO)로 한정한다.
<>이사회 회장은 완전한 독립을 유지한다.
<>10년이상 근무한 이사는 독립성에 결함이 있다고 본다.
<>70세이상의 이사회 멤버는 전체의 10%이하로 한다.
이 모두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CEO에 대항하는 힘을 주기 위한
조치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
![[속보] 美국무부, 韓국회 계엄해제 결의에 "준수되길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