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추천서] 'No 라고 말할수 있는 중국' .. 김준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이 개방이후 공식적으로 "No"를 선언한 것은 95년 중.미 지적재산권
보호협약 체결시 미국측의 유례없는 양보를 받아내면서부터다.
이때 한 일본 통신사의 베이징 주재기자가 감탄스런 어조로 "일본에는
미국과 무역협상때 중국의 오의(대외경제무역부장) 여사처럼 과감히 "No"라고
말할 인물이 없다"라는 내용을 본국에 타전했다는데서 "중국의 No 신화"가
만들어진 듯하다.
"No라고 말할수 있는 중국"은 내 생각과 달리 "위대한 중국"에 대한 감동
이나 자랑을 써놓은 책이 아니다.
세계를 향해 중국의 우월함을 외친 것도 아니다.
조국의 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비하에 빠져드는 중국인을 향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후에도 중국인은 "왜 중국은 No라고
말하는가" "아직도 No라고 말하는 중국" 등 이른바 "No" 시리즈를 계속
펴내고 있다.
그만큼 중국인에게도 "No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일까.
이 책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 "No라고 말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절한때 "No"라고 말할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러해야 할 시점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가.
일본 기자의 지적대로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대표는 있는가.
굳이 국가적인 차원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
나 자신은 사회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적절한 때에 "No"라고
말할수 있을 만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볼 일이다.
지난해 중국 외교부는 중남해에서의 외신기자 정례 브리핑을 영어없이
중국어로만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외신기자들의 반응은 더 놀라운 것이었다.
"하긴 백악관에서도 자기네 나라 말인 영어로만 발표하니까".
그후 실제 중국은 외신기자들에게 중국어로만 공식 브리핑을 했고 그들이
내보내는 뉴스들은 차질없이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익숙해졌다.
힘을 가진 자의 "No"만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책은 "No라고 말할수 있는 나"로 당당하게 서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인가를 일깨워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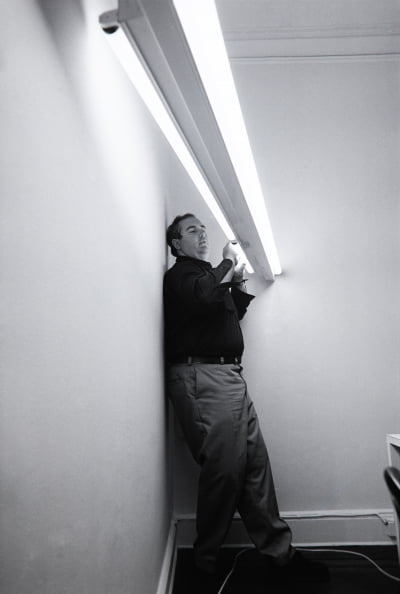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美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A.37133868.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