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때 조선에 주둔한 중국 군사들이 조선인들이 회를 잘 먹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침을 뱉었다.
"소의 밥통 고기나 처녑같은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을 싼 것이다.
이것을 회로 먹는다니 어찌 뱃속이 편안하겠는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국인들은 잘익은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것은 오랑캐의 음식이다"고 욕을 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의 한 선비는 이렇게 응답했다.
""논어"를 보면 짐승과 물고기의 날고기를 썰어 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일찌기 공자를 비롯한 고인들이 즐겨 들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의 말이 그렇게 지나친가"
그로 미루어 한민족이 예로부터 날쇠고기를 먹었음을 알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숭유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자가 회를
먹었다는 선례에 따라 별 저항감 없이 회를 널리 먹게 되었다.
그 결과 육회 간 처녑등 날쇠고기는 한국인의 기호식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시의전서"에는 날쇠고기 요리들 가운데 가장 선호되어온 육회의 전통적
조리법이 기술되어 있다.
"기름기 없는 연한 쇠고기의 살을 얇게 저며 술에 담가 핏기를 빼고
가늘게 채썬다.
파와 마늘을 다져 후추가루 깨소금 잣가루를 많이 섞는다.
초고추장은 후추나 꿀을 섞어 식성대로 만든다"
그처럼 먹음직스럽던 육회도 근년에 소가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었다는
판정이 심상찮게 나오면서 그 자취를 감출지경에 이르렀다.
거기에 수입 쇠고기가 범람하면서 육회를 기피하는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연초부터의 영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파동에다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의 병원성 대장균인 O-157과 식중독 병원균인 리스테리아균의
검출이 겹쳐서 그 파장이 클 것 같다.
물론 한우에는 이러한 치명적인 병원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상거래풍토에서 날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한민족이 몇백년동안 선호해 오던 기호식이 영영 사라져 버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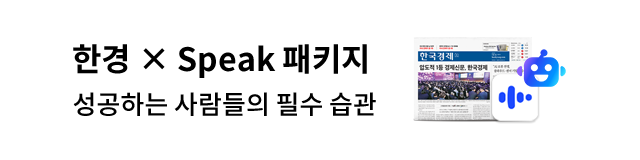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한경에세이] 규제보다 계도가 중요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691829.3.jpg)
![[특파원 칼럼] 미국은 워라밸이 좋을 것이란 착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1367266.3.jpg)
![[취재수첩] 공포의 대상이 된 중국의 '테크 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493710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