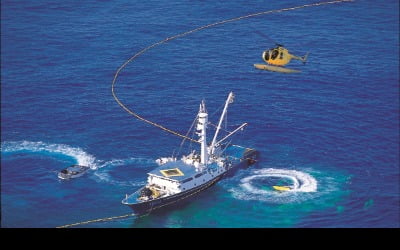['정리해고' 본격 논의] '외국에선 어떻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사.정 대타협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각자 일정 수준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약속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곤 했다.
94년말 페소화 폭락사태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던 멕시코 뿐만이 아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물론 일본이나 호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유럽국가들에서 그렇다.
멕시코처럼 경제주체들이 한시적으로 사회협약을 맺고 실행한 경우도 있다.
비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만으로도 위기를 넘긴 국가도 있다.
네덜란드는 2차대전직후 경제주체들이 사회적합의를 이룸으로써 경제부흥에
성공했다.
전쟁이 끝난지 5년뒤인 50년 노.사.정.공익대표로 사회경제협의회를 구성,
경제주체간 쟁점들을 해결했다.
특히 82년에는 불황 타개를 목표로 고용유지와 임금안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 경기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협의회는 지금도 매월 한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네덜란드와는 달리 위기때마다 경제주체들이 한시적 사회협약을 체결,
위기를 넘긴 국가도 있다.
멕시코가 대표적이다.
멕시코는 페소화가 폭락한 94년말 사태발생 보름만에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정.농민 대표는 사회협약수행위원회를 구성, 95년1월 긴급경제계획을
마련했으며 95년에는 국민협정, 96년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동맹을 맺어
실천함으로써 2년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독일과 일본은 비공식적 사회합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군으로 분류
된다.
특히 독일은 사회합의로 위기를 넘긴 대표적 국가다.
지금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이 67년의 협조행동간담회이다.
독일 정부는 65년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재정적자 누적 등의 경제위기에
직면, 노사 양측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단체 대표와 중앙은행총재, 현인회의 전문가 및 경제부처장관
등으로 협조행동간담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의 물가
억제 등이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불황을 타개했다.
독일은 통일후인 93년에도 연대협정을 통해 통일비용 분담을 둘러싼 경제
주체들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통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노조가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합의를
도출, 난국을 극복하곤 했다.
일본은 70년 1월 노사대표 학자 등 30명으로 산업노동간담회라는 비공식
기구를 만들어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시작
했다.
지금도 연간 9회 열리는 간담회에는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사정대타협을 성사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곤 했다.
물론 합의나 협약은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노사정대타협은 실천이 뒤따랐을 때만 실효를 거두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오래전부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각자 일정 수준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약속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곤 했다.
94년말 페소화 폭락사태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던 멕시코 뿐만이 아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물론 일본이나 호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유럽국가들에서 그렇다.
멕시코처럼 경제주체들이 한시적으로 사회협약을 맺고 실행한 경우도 있다.
비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만으로도 위기를 넘긴 국가도 있다.
네덜란드는 2차대전직후 경제주체들이 사회적합의를 이룸으로써 경제부흥에
성공했다.
전쟁이 끝난지 5년뒤인 50년 노.사.정.공익대표로 사회경제협의회를 구성,
경제주체간 쟁점들을 해결했다.
특히 82년에는 불황 타개를 목표로 고용유지와 임금안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 경기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협의회는 지금도 매월 한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네덜란드와는 달리 위기때마다 경제주체들이 한시적 사회협약을 체결,
위기를 넘긴 국가도 있다.
멕시코가 대표적이다.
멕시코는 페소화가 폭락한 94년말 사태발생 보름만에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정.농민 대표는 사회협약수행위원회를 구성, 95년1월 긴급경제계획을
마련했으며 95년에는 국민협정, 96년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동맹을 맺어
실천함으로써 2년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독일과 일본은 비공식적 사회합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가군으로 분류
된다.
특히 독일은 사회합의로 위기를 넘긴 대표적 국가다.
지금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이 67년의 협조행동간담회이다.
독일 정부는 65년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재정적자 누적 등의 경제위기에
직면, 노사 양측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단체 대표와 중앙은행총재, 현인회의 전문가 및 경제부처장관
등으로 협조행동간담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기업의 투자 확대, 정부의 물가
억제 등이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불황을 타개했다.
독일은 통일후인 93년에도 연대협정을 통해 통일비용 분담을 둘러싼 경제
주체들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통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노조가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합의를
도출, 난국을 극복하곤 했다.
일본은 70년 1월 노사대표 학자 등 30명으로 산업노동간담회라는 비공식
기구를 만들어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시작
했다.
지금도 연간 9회 열리는 간담회에는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사정대타협을 성사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곤 했다.
물론 합의나 협약은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노사정대타협은 실천이 뒤따랐을 때만 실효를 거두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자선사업가'가 어떻게 29억 슈퍼카를 타냐…비난 쏟아졌다 [박의명의 K-인더스트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38166.3.gif)
!["500층 앞두고 와르르"…테슬라 '쇼크'에 서학개미 '눈물' [테슬람 X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383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