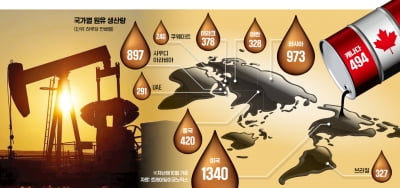특히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승객들간에, 혹은 기사와 승객간에 오가는
푸념섞인 토론을 자주 들을 수 있다.
며칠 전 아는 사람을 통해 한 택시기사의 민성을 듣게 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앞만보고 나가던 시절에도 변두리 그 흔한 "스탠드빠"에서
맥주 한잔 마실 여유가 없었고 등교하던 한 초등학생이 "따블" "따블"을
외칠때도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그 초등학생을 태워야 했던
택시기사에 불과했다.
그때도 내겐 더 나은 생활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거액의 실업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승객으로 탔던 그 사람은 할말을 잊었단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한잔 먹은 술기운이 확 가셨단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을 할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에 목적지에 빨리 닿기만을 바랐단다.
오로지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지금까지 모두가 바빴던 것이 사실이다.
주위를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보고 뛰었던 것이다.
올바른 경제성장을 통한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의
소득분배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신만의 모래성을 쌓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우리 전통 미풍양속에 복돼지라는 게 있다.
부모님의 회갑날을 맞아 수복을 빌거나 제삿날 명복을 비는 자선으로
돼지새끼 아홉마리를 사서 아홉집에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
새끼를 낳을 때마다 한두마리씩 돌려주는 조건부다.
이를 복돼지라 한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두세마리의 돼지를 기르게 마련이었다.
농사외의 생업으로 먹고사는 가구가 10%, 나머지 75%가 논 밭 한뙈기없이
품팔아 먹고사는 가구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농촌구조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이 범죄 하나 없이 전혀 각박하지 않게 살아낸데는
이같은 소득분배의 미풍이 모세혈관처럼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거품이 걷히고 모래성들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시점에서
그 택시기사의 말은 의미있게 다가온다.
부의 적정한 분배를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수 있었다면 택시기사의 절망적인 소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경제상황도 바닥이 다 드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조상들의
분배의 미풍을 본받는 것은 어떨까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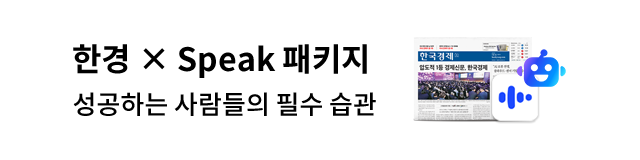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한경에세이] Why에 대한 공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39718266.3.jpg)
![[기고] 위기의 中企…디지털·AI로 돌파구 모색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9323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