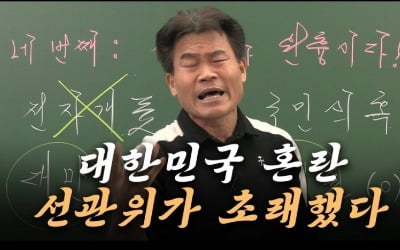충렬왕24년) 국학을 개칭해 "성균감"으로 한데서 비롯됐다.
그후 성균감은 다시 국자감으로 환원됐다가 1326년 성균관으로 복구됐다.
고려의 성균관은 조선왕조가 들어선 뒤에도 그대로 이어져 국가의 관리양성
을 위한 최고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왕조의 한양천도에 따라 지금의 성균관대 자리로 터가 잡혔다.
1395년(태조4년)에 건축공사를 시작, 3년만인 1398년 대성전과 부속건물이
완공됐다.
지금부터 꼭 6백년전의 일이다.
개축초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1백50명이었으나 세종때는 200명으로 늘어났다
정원중 반은 생원 진사의 자격을 갖춘 정규생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사학의
생도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와 국가유공자의 자제였다.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했다.
유생은 동서.재에 기숙하면서 아침.저녁식사때마다 도기에 서명을 하면
원점을 얻고 3백점을 얻은 자, 즉 통산 3백일 이상을 기숙하며 공부한 유생
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특전을 주었다.
일정한 재학기간이 따로 없고 과거에 합격하는 날이 졸업일이었던 셈이다.
기숙사생활은 "재회"라는 유생자치기구가 감독했다.
때로는 재회가 조정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해 집단시위인 소행, 수업을 거부
하는 권당, 동맹휴학인 공관으로 왕과도 맞서는 대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중종때 유생들의 불교배척운동은 유고이념수호에 버팀목이 됐다.
폭군 연산군때는 성균관이 연회장을 겸한 활터가 되고 임란때는 건물이
전소되는 수난도 당했다.
일제때는 교육기능이 상실되고 석전이나 재산관리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6백년의 전통을 지닌 성균관대가 오는 23일부터 옥스퍼드 하이델베르크
소르본 등 세계굴지의 명문대 총장 16명이 참가하는 "세계총장학술대회"
"조선시대성균관재현" 등 갖가지 기념행사를 갖는다는 소식이다.
조선왕조의 성균관은 순수한 선의기준(수선지지)으로 대접받았다.
우리교육의 유구한 역사를 재점검하고 요즈음 천대받지만 성균관의 건학이념
이기도 한 인 의 예 지로 요약되는 "아시아적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


![[한경에세이] '녹색갈증'과 농촌의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9108475.3.jpg)
![[기고] 방치할 수 없는 '그냥 쉰' 청년 45만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86834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