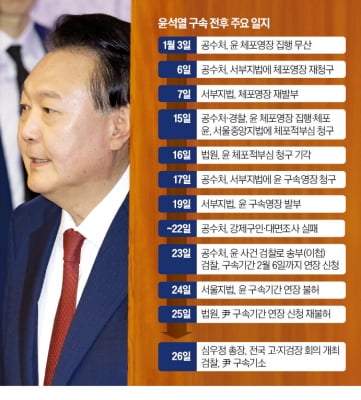[사회면톱] 법정관리기준 '오락가락' .. 신뢰성 의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정관리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법정관리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인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평가방법에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때문이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고 업종과
기업크기에 따라서도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법원은 관리위원회나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법정관리신청기업의 존속-청산
가치를 산출, 두 가치를 비교해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한다.
즉 존속가치가 높으면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청산가치가 높으면 기각된다.
경제성없는 기업은 조기에 도태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태흥피혁과 신화그룹의 법정관리신청사건에서 이 룰이 깨졌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태흥피혁과 신화그룹의 존속가치는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태흥피혁은 청산가치가 3백59억원, 존속가치가 9백69억원이었다.
신화그룹은 청산가치가 1백24억원, 존속가치가 무려 1천62억원이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두 기업의 법정관리는 기각돼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H변호사는 "현행 존속, 청산가치 계산방법은 자산
사업성외의 변수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흥피혁과 신화그룹은 부도후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는
해체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존속가치가 높게 나왔다.
자산 부채만으로 기업회생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증이다.
또 현행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계산방법은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단점도 안고 있다.
일례로 철강산업 등 초기투자가 많은 기업은 부도가 났을 때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
업종에 따라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부도후 청산가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부채가 많고 일시적인 자금흐름이 막힐 경우 대기업의 존속가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법정관리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의 한 판사는
"존속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법정관리개시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존속가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항상 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청산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한
만큼 재판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
법정관리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인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평가방법에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때문이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고 업종과
기업크기에 따라서도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법원은 관리위원회나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법정관리신청기업의 존속-청산
가치를 산출, 두 가치를 비교해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한다.
즉 존속가치가 높으면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청산가치가 높으면 기각된다.
경제성없는 기업은 조기에 도태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태흥피혁과 신화그룹의 법정관리신청사건에서 이 룰이 깨졌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태흥피혁과 신화그룹의 존속가치는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태흥피혁은 청산가치가 3백59억원, 존속가치가 9백69억원이었다.
신화그룹은 청산가치가 1백24억원, 존속가치가 무려 1천62억원이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두 기업의 법정관리는 기각돼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H변호사는 "현행 존속, 청산가치 계산방법은 자산
사업성외의 변수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흥피혁과 신화그룹은 부도후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는
해체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존속가치가 높게 나왔다.
자산 부채만으로 기업회생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증이다.
또 현행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계산방법은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단점도 안고 있다.
일례로 철강산업 등 초기투자가 많은 기업은 부도가 났을 때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
업종에 따라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부도후 청산가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부채가 많고 일시적인 자금흐름이 막힐 경우 대기업의 존속가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법정관리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의 한 판사는
"존속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법정관리개시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존속가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항상 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계기업의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청산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한
만큼 재판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
![[포토] 부산 광안리에 뜬 ‘푸른 드론 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3317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