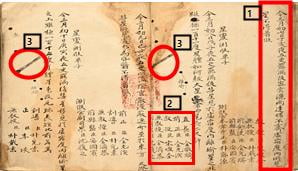왜 옮겼나...아직 불편많다 .. '정부대전청사 입주 100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로 정부대전청사 시대가 열린지 꼬박 1백일이 된다.
지난 8월26일 관세청이 8개 외청과 3개기관중 마지막으로 대전청사에 이전
완료한게 기준시점.
"제2의 행정수도"란 핑크빛 플래카드를 내걸고 숨가쁘게 달려온 1백일.
3천8백여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부대전청사는 당초 행정기능의 지방분권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큰뜻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아직은 순기능보다는 역작용이 눈에 더 띄는 게 사실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사 ="몸은 대전에 마음은 서울에"
대전청사 공무원들의 탄식이다.
실제로 대전청사 공무원 3천7백65명중 1천1백59명이 "나홀로족"이다.
서울과 대전을 매일매일 폴짝 폴짝 뛰어다닌다 해서 "캉가루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출퇴근 공무원도 2백여명이나 된다.
전체의 3분의 1이 대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셈.
"이중 생활"을 하면 비용이 두배로 들뿐아니라 몸도 피곤하다.
<>업무의 효율은 어떨까 =입주기관장들과 주요 직책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행으로 "대전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부단위 중앙행정조직이 몰려있는 세종로와 과천청사로의 업무협의를 위해
대전청사를 비우는 경우가 너무 잦다는 얘기다.
"길거리 행정"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국회가 열리면 상황은 최악이다.
기관장은 국회에 눈도장을 찍으러 가느라 바쁘다.
수행 공무원들도 뒷바라지하러 줄줄이 따라 나서야한다.
청마다 어림잡아 30명 이상이 여의도행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아직은 기대밖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종찬씨(45)는
"대전청사 주변만 가면 짜증이 난다"며 "수요가 늘어난 건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별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부동산의 경우 수요보단 공급이 훨씬 많았던 터라 기지개를 켜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청사를 바라보고 있는 법원.검찰청 주변 상가만 활기를 띠고 있을 뿐.
이곳 건물 임대료는 평당 8백만~1천만원으로 입주이전보다 많게는 배이상
뛰었다.
그러나 청사이전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일 만은 아니란 주장도 많다.
박성효 대전시 지역경제국장은 "청사이전의 경제적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며 "조달청 등이 조만간 지역업체 제품 구매를
늘릴 예정인만큼 이것이 실시되면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퇴근 이후의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사교범위가 줄어든 걸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울의 지기들을 못만나니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게된다고
하소연한다.
저녁약속으로 대변되는 "밤문화"가 따로 없다는 얘기다.
기껏 동료나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는게 전부이다.
요즘엔 청사내 다른 청 동기생이나 고향 선후배를 찾아 "타향살이"의 한을
나누곤한다.
B청의 K국장은 "사교범위가 좁아지니 갇혀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고백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서울에서보다 술을 드는 회수가 늘어났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확보되는 만큼 책을 읽거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민원인들 크게 줄었다=대전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1천명선.
조달청의 경우 하루평균 3백40여명의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는 서울에 있을때의 3분의1 수준.
민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대전이 거리상 결코 가깝지 않은데다 E메일
등 각종 통신수단으로 웬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마냥 줄 것같지는 않다.
경기도 안양에서 사업을 하는 김동철씨(54)는 ""대면접촉"이 없으면 뭔가
찜찜하다"며 "관청로비도 경쟁인 이상 찾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
지난 8월26일 관세청이 8개 외청과 3개기관중 마지막으로 대전청사에 이전
완료한게 기준시점.
"제2의 행정수도"란 핑크빛 플래카드를 내걸고 숨가쁘게 달려온 1백일.
3천8백여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부대전청사는 당초 행정기능의 지방분권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큰뜻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아직은 순기능보다는 역작용이 눈에 더 띄는 게 사실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사 ="몸은 대전에 마음은 서울에"
대전청사 공무원들의 탄식이다.
실제로 대전청사 공무원 3천7백65명중 1천1백59명이 "나홀로족"이다.
서울과 대전을 매일매일 폴짝 폴짝 뛰어다닌다 해서 "캉가루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출퇴근 공무원도 2백여명이나 된다.
전체의 3분의 1이 대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셈.
"이중 생활"을 하면 비용이 두배로 들뿐아니라 몸도 피곤하다.
<>업무의 효율은 어떨까 =입주기관장들과 주요 직책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행으로 "대전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부단위 중앙행정조직이 몰려있는 세종로와 과천청사로의 업무협의를 위해
대전청사를 비우는 경우가 너무 잦다는 얘기다.
"길거리 행정"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국회가 열리면 상황은 최악이다.
기관장은 국회에 눈도장을 찍으러 가느라 바쁘다.
수행 공무원들도 뒷바라지하러 줄줄이 따라 나서야한다.
청마다 어림잡아 30명 이상이 여의도행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아직은 기대밖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종찬씨(45)는
"대전청사 주변만 가면 짜증이 난다"며 "수요가 늘어난 건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별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부동산의 경우 수요보단 공급이 훨씬 많았던 터라 기지개를 켜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청사를 바라보고 있는 법원.검찰청 주변 상가만 활기를 띠고 있을 뿐.
이곳 건물 임대료는 평당 8백만~1천만원으로 입주이전보다 많게는 배이상
뛰었다.
그러나 청사이전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일 만은 아니란 주장도 많다.
박성효 대전시 지역경제국장은 "청사이전의 경제적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며 "조달청 등이 조만간 지역업체 제품 구매를
늘릴 예정인만큼 이것이 실시되면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퇴근 이후의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사교범위가 줄어든 걸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울의 지기들을 못만나니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게된다고
하소연한다.
저녁약속으로 대변되는 "밤문화"가 따로 없다는 얘기다.
기껏 동료나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는게 전부이다.
요즘엔 청사내 다른 청 동기생이나 고향 선후배를 찾아 "타향살이"의 한을
나누곤한다.
B청의 K국장은 "사교범위가 좁아지니 갇혀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고백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서울에서보다 술을 드는 회수가 늘어났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확보되는 만큼 책을 읽거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민원인들 크게 줄었다=대전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1천명선.
조달청의 경우 하루평균 3백40여명의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는 서울에 있을때의 3분의1 수준.
민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대전이 거리상 결코 가깝지 않은데다 E메일
등 각종 통신수단으로 웬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마냥 줄 것같지는 않다.
경기도 안양에서 사업을 하는 김동철씨(54)는 ""대면접촉"이 없으면 뭔가
찜찜하다"며 "관청로비도 경쟁인 이상 찾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