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독서에세이) '불황경제학' .. 금융구조 튼튼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도서명 : ''불황경제학''
저자 : 폴 크루그먼 교수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By Paul Krugman, W.W.Norton &
Company, New York 1999) ]
-----------------------------------------------------------------------
되돌아보고 평가하기는 쉽지만 앞을 내다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정확하게 내다보기도 힘들지만 정책으로 인한 사회구성층의 이해상충성이
정책시행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직업상 보도하고 분석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예측하고 대응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
학자는 전자에 속하지만 때로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아마도 미국 MIT의 폴 크루그먼(P.Krugman) 교수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학자인 것 같다.
다소 시의성을 잃기는 했으나 금년에 크루그먼은 지금의 세계 금융혼란을
예상하고 분석한 "불황경제학(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By
Paul Krugman,W.W.Norton & Company,New York 1999)을 펴냈다.
이 책은 "위기 이전의 아시아:단기경로의 기적(2장)"을 포함하여 9개장과
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루그먼은 지금 세계경제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다.
1997년 7월 대수롭지 않게 보인 태국 바트화 절하가 어떻게 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를 초토화할 만큼 커다란 금융폭풍을 몰아왔고 각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첫째
과제다.
또 불충분한 총수요가 1980년대 중반까지도 세계경제의 골치거리 중의
하나였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게 하는 대신 대규모 디플레이션 야기 위험을
지니고 있는데도 학자나 정책담당자는 이를 왜 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과제다.
이 두 가지 과제 중 아시아와 관련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서구학자들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원죄로 보고 그 타파를
대책으로 이해한다.
물론 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고자본주의에서 파생된
정경유착까지 기적의 한 요인으로 평가했으나 지금은 철저한 원죄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공했는데 1997년에만 왜 위기를 야기했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체질 강화 없는 과도한 개방과 과다차입 및 비효율적 투자가
연고자본주의 체제의 비효율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개혁기조와 방향은 무엇일까.
금융산업과 기업의 부실을 정부가 구조해 준 도덕해이 때문일까.
이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크루그먼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크게 세가지를 얘기한다.
(1) 헤지펀드 등 외국투기자본의 공격 (2) 유동성이 매우 강한 세계적
규모의 금융자본 축적 (3) 새 금융자본주의시대에 대한 대응자세 부적절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정책오류를 세계적 외환위기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비판한다.
만일 월가가 붕괴되고 미국경제가 불황위험에 처하면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체없이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는 긴축을 완화할 것이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는 반대였다.
크루그먼은 외화유출을 방지해서 외채보유기업 파산과 외환시장 붕괴를
막으려는 IMF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매우 높은 이자율과 긴축이 국내
기업의 파국적 도산을 야기했다고 꼬집는다.
문제는 불황이 자가발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초가 튼튼해도
금융구조가 취약하고 시장상황이 불안하면 정책대응은 후자에 부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금융시장구조 및 금융자본의 시장행동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이 점은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로 자본유출방지책을 선호한다.
또 기업의 과다 차입 및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입과세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나 읽고 나면 무엇을 내다볼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시책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씁쓸한 뒷맛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대학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일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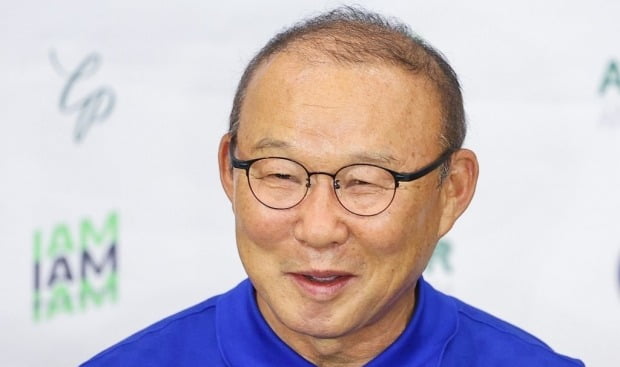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이런 증상' 보이면 당장 병원 가야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99.30423608.3.jpg)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