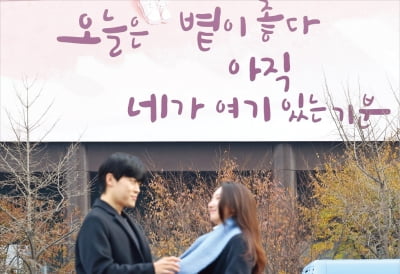국내 최고 오페라잔치 자리매김 .. 오페라페스티벌 결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술의전당 가을 오페라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파우스트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3회째인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첫회에 못지 않은 관객동원과 작품수준으로
오페라 페스티벌이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레파토리 선정과 캐스팅 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성악
부문도 기대에 못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매회 공연때마다 평균 67%의 객석이 찼고 이중
유료관객은 71%에 달했다.
지난해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 페스티벌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프랑스의 유명 지휘자 장 이브 오송스와 독일의 무대감독 하랄트 토르를
기용해 파우스트의 작품성을 높이려 애쓴 점도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음악 칼럼니스트인 박종호씨는 "오페라 페스티벌이 회를 거듭하면서 무대
스탭과 기술파트의 인프라가 축적되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작품들의 음악과 연출도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를 레퍼토리로 선택한 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가 높았다.
연주용으로 만들어진 "콘서트 오페라"인 만큼 연출이 너무나 힘이 든
파우스트를 굳이 선택했어야 했느냐는 얘기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고 이를 무대화하는 의욕은 좋지만 관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과 예술적 체험을 줬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레퍼토리도 많은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파우스트는 원어인 프랑스어로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음악적인 측면을 위해선 원어로 불렀어야 했는데 국내 가수들이 프랑스
노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오페라계가 하루 빨리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음으로 캐스팅의 문제가 노출됐다.
나비부인을 만든 국제오페라단의 김진수 단장이 두차례 핑커톤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원성을 샀던 게 대표적인 예.
김 단장은 "테너 이현씨외에 핑커톤을 소화할 만한 가수를 찾지 못해 내가
직접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래와 연기 모두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캐스팅할 테너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테너가 절대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음악계 인사들은 지적했다.
또 라보엠에서 로돌포역을 맡기로 했던 테너 이원준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자 이탈리아 가수인 알도 필리스타드(62)를 불러온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
예술의전당 측은 단기간에 호흡을 맞추고 로돌포역을 소화할 수 있는 테너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미 마르첼로 콜리네 등을 맡은 국내 가수들보다 훨씬 기량이
떨어지는 가수를 이탈리아 출신이란 명분만 내세워 캐스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장규호 기자 seini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
막을 내렸다.
3회째인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첫회에 못지 않은 관객동원과 작품수준으로
오페라 페스티벌이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레파토리 선정과 캐스팅 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성악
부문도 기대에 못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매회 공연때마다 평균 67%의 객석이 찼고 이중
유료관객은 71%에 달했다.
지난해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 페스티벌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프랑스의 유명 지휘자 장 이브 오송스와 독일의 무대감독 하랄트 토르를
기용해 파우스트의 작품성을 높이려 애쓴 점도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음악 칼럼니스트인 박종호씨는 "오페라 페스티벌이 회를 거듭하면서 무대
스탭과 기술파트의 인프라가 축적되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작품들의 음악과 연출도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를 레퍼토리로 선택한 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가 높았다.
연주용으로 만들어진 "콘서트 오페라"인 만큼 연출이 너무나 힘이 든
파우스트를 굳이 선택했어야 했느냐는 얘기다.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고 이를 무대화하는 의욕은 좋지만 관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과 예술적 체험을 줬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레퍼토리도 많은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파우스트는 원어인 프랑스어로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음악적인 측면을 위해선 원어로 불렀어야 했는데 국내 가수들이 프랑스
노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오페라계가 하루 빨리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음으로 캐스팅의 문제가 노출됐다.
나비부인을 만든 국제오페라단의 김진수 단장이 두차례 핑커톤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원성을 샀던 게 대표적인 예.
김 단장은 "테너 이현씨외에 핑커톤을 소화할 만한 가수를 찾지 못해 내가
직접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래와 연기 모두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캐스팅할 테너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테너가 절대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음악계 인사들은 지적했다.
또 라보엠에서 로돌포역을 맡기로 했던 테너 이원준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자 이탈리아 가수인 알도 필리스타드(62)를 불러온 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
예술의전당 측은 단기간에 호흡을 맞추고 로돌포역을 소화할 수 있는 테너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미 마르첼로 콜리네 등을 맡은 국내 가수들보다 훨씬 기량이
떨어지는 가수를 이탈리아 출신이란 명분만 내세워 캐스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장규호 기자 seini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