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표현수단으로 술을 마신다"
1백여년전 한국에 와 있던 한 러시아외교관은 당시 우리 음주풍속을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한국인의 음주벽을 제대로 짚어 낸 인물도 없을 성 싶다.
수필가였던 김진섭의 ''주찬''이라는 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술의 공덕은 지극히 커서 우리는 이를 슬퍼마시며, 기뻐마시며, 분하다하며
마시며, 봄날이 화창하다하여 마시며, 여름날이 덥다 하여 마시며, 겨울날이
춥다 하여 마신다"하고 털어 놓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북돋아주며 조절해주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술이라고 예찬했다.
아무리 술의 본질이 어느 정도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해도 외국인들에
비하면 한국인들의 음주관은 지극히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요즘도 역시 그렇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조사결과는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국민 1인당 소주 59병, 맥주 61병, 양주는 1.3병이나 마신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7.3l나 된다.
특히 값비싼 양주소비는 98년보다 2배가 늘었다는 소식이다.
음주량이 이렇게 는 것은 IMF한파를 어느정도 극복했다는 기쁨때문
이었을까, 아니면 새천년을 맞는다는 희망때문이었을까.
지난해 세계 알코올소비 등급을 보면 1위는 국민 1인당 11.3l인
포르투갈이었고 룩셈부르크(11.2l) 프랑스(10.9l)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도 7.3l인 러시아와 동급이 됐으니 상위 그룹에 들날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
술을 들지 않는 성인이나 어린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모주꾼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는 정약용의 말은
좀 지나치다 해도 적어도 "생명수"로도 불리던 술이 죽어서 먹는 "열반주"가
되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건강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음주문화가 아쉽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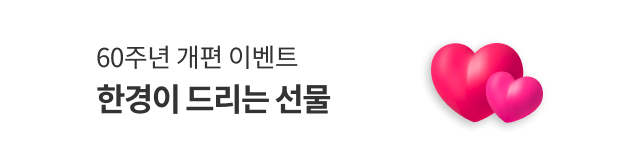
![[천자칼럼] '학력 1위' 한국 국회, 신뢰는 꼴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541.3.jpg)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