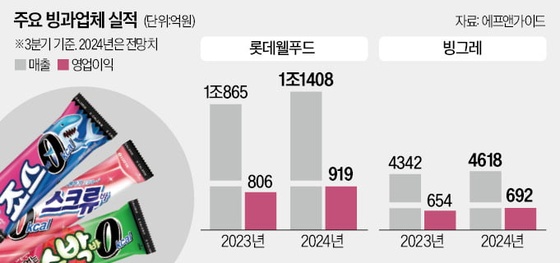[취재여록] 갈길 먼 신용사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카드 복권제가 실시후 카드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시장규모는 작년보다 두배가량 늘어난 2백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삼성 임직원들에게 처음 카드를 발급한 지 30여년만에 카드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카드 복권제"라는 아이디어는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율적 조세 부과를 "거위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털을 뽑는 기술"에 비유했을 때 카드 복권제는 음성.탈루 소득을 줄이고 세원을 노출시키는 데 "기가 막힌" 묘수라는 것.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카드시장의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신용의 증가라는 "질적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분쟁의 봇물"로 이어진다.
실제 소비자보호원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달동안 카드민원건수는 월평균 8백여건에 달했다.
작년보다 51%가량 늘었다.
카드 사용이 늘어난 시점에 맞춰 분쟁건수도 뛴 셈이다.
왜 그럴까.
일단 카드 사용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카드 연회비가 없고 선물을 준다고 해 가입했더니 나중에 계좌이체를 시켜놓고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갔다. 계약 위반이다" "대금 상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왜 카드를 발급하나" "카드사인지,폭력조직인지 알수 없다. 연체료 독촉하는데 쌍소리는 왜 하나"
민원자들의 얘기를 보면 카드사와 사용자간엔 이미 "신용"을 찾아볼 수 없다.
먹을게 늘어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사탕발림"은 물론 "눈속임"까지도 동원해야 한다는 장사속만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쪽에서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할말이 없는 게 아니다.
대부분이 임시직인 카드판매원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을 일일히 통제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또 연체료 독촉에 대해서는 "여신업체는 부실채권을 줄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신용을 담보로 대출했는데 제때 갚지 않는 것은 사용자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그렇게 연체가 문제라면 부실고객엔 카드발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대출할때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를 차등화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 카드사들이 그럴만한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늘어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도 카드는 많이 발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욕심만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등 대기업들까지 가세하게 되면 아수라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신용카드 시장 확대가 자칫 신용사회 보다는 "저신뢰사회"의 역회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박수진 경제부 기자 parksj@ked.co.kr
!["예쁜데 승차감은 포기" 편견 깼다…'미니 쿠퍼' 파격 변신 [신차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52050.3.jpg)



![메타 하루 만에 5.8% 급등…AI 투자 낙관한 월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B2024042507141393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