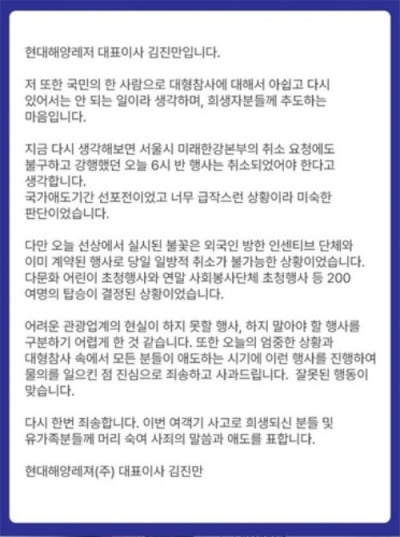[한국 노동시장 개혁 국제회의] 공공근로사업 강화로 자활능력 배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노동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가 20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의는 외환위기를 극복중인 한국경제가 향후 보완해야할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관심을 끌었다.
고든 베처만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험,노동시장 규제 등을 평준화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마틴 OECD 국장도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기위해 퇴직금 등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행사기간중 발표된 주요 논문과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
<>실업 부조제도의 도입 가능성(박영범 한성대 교수)=외환위기이후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 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은 이는 전체 실직자의 20%에도 못 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확인할수 있는 행정체계도 미흡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없앨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회부조를 시행할 여건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이들의 자산을 정확히 조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가 2002년까지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을 유보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새로운 제도아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건부 수급자에게 적절한 자활사업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현행 규정상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만 하면 조건부수급자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도 문제다.
공공직업안전망이 부실한 현실에선 새로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보완키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한다.
<토론자 황덕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해 실업대책의 수혜율이 낮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노동이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도 다른 원인이다.
발표자는 일용직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공공근로를 유지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용직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는만큼 고용보험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공공근로를 일정규모이상 유지하자는 주장은 적절치않다.
오히려 공공근로의 대부분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의 일부로 흡수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번 회의는 외환위기를 극복중인 한국경제가 향후 보완해야할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관심을 끌었다.
고든 베처만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험,노동시장 규제 등을 평준화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마틴 OECD 국장도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기위해 퇴직금 등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행사기간중 발표된 주요 논문과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
<>실업 부조제도의 도입 가능성(박영범 한성대 교수)=외환위기이후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 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은 이는 전체 실직자의 20%에도 못 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확인할수 있는 행정체계도 미흡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없앨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회부조를 시행할 여건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이들의 자산을 정확히 조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가 2002년까지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을 유보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새로운 제도아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건부 수급자에게 적절한 자활사업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현행 규정상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만 하면 조건부수급자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도 문제다.
공공직업안전망이 부실한 현실에선 새로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보완키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한다.
<토론자 황덕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해 실업대책의 수혜율이 낮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노동이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도 다른 원인이다.
발표자는 일용직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공공근로를 유지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용직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는만큼 고용보험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공공근로를 일정규모이상 유지하자는 주장은 적절치않다.
오히려 공공근로의 대부분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의 일부로 흡수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