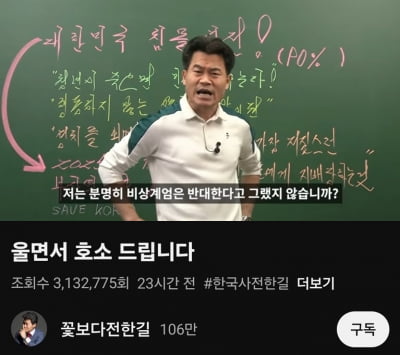['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7) 끝. '의료보험'..여전히 불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약분업을 빌미로한 이번 의료대란의 뿌리는 의료보험문제에서 찾아 볼수 있다.
의료계가 겉으로는 "1백% 진료권 확보"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수입이 줄고 있는데 있다.
의료계도 "폐업과 파업투쟁이 의약분업으로 시작됐지만 의료보험 실시이후 누적된 불만이 분출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저수가,저급여,저부담"으로 대표되는 의료보험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부담(의료보험료)를 높여 각종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수가)을 올려야만 수입(급여)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낮은 수가를 유지해 의료계가 약가마진을 챙기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성행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진료횟수를 늘리거나 약을 과다투여하는 "박리다매식 의료서비스"도 초래했다.
환자들은 의료보험료를 내면서도 호주머니에서 따로 비싼 진료비를 내야할 처지여서 병원가기가 겁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보험료를 1백%이상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료대란으로 "멍든" 국민들이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의보료 인상을 선뜻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정부는 지난 77년 의료보험을 5백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이때 정부는 수가를 원가의 50~55% 선에 맞췄다.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경우 도저히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를 수선하는 카센터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병.의원보다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23년동안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취약한 의료보험 재정을 이유로 들며 의료계의 주장을 물리쳤다.
의료보험이 시작된 77년을 1백으로 볼때 지난 98년말 현재 수가는 514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507수준이므로 낮은 수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 만큼만 의보수가를 올려온 셈이다.
<>국민들의 피해=낮은 수가는 의료계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약가마진을 챙기고 의료보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진료행위,과잉진료,유령환자 만들기 등을 편법을 쓰도록 만들었다.
또 특진료,비싼 입원실료와 밥값 등의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약가마진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병.의원에서 1개의 약을 사면서 심할 경우 10개까지 공짜로 같은 약을 받았다.
병.의원은 1개 값으로 받은 11개의 약을 투약하면서 의료보험공단에는 11개의 약값을 신청해왔다.
제약회사는 이런 종류의 덤핑을 하기위해 처음부터 약값을 높게 책정했다.
결국 국민은 턱없이 비싼 약을 사먹은 꼴이 됐다.
낮은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만들었다.
의사들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할 처지여서 충분히 상담을 해주지 못했다.
"3시간 대기,3분 진료"가 일상화돼 자연히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만도 높아졌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초음파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많아 의료보험료를 낸 환자들이 별도로 내야하는 진료비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총 진료비의 48%만을 의료보험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2%는 직접 부담하고 있다.
중병에 걸릴 경우 가정경제에 파탄이 일어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해결책=의료보험을 정상화시키려면 의보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보험 적용대상 진료행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의료계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현재의 2백6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중환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충실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때 조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3일 당정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이점을 인정했다.
의료보험료가 낮은 "저부담"체계를 의약분업을 계기로 고쳐 의료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가겠다는 것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의료계가 겉으로는 "1백% 진료권 확보"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수입이 줄고 있는데 있다.
의료계도 "폐업과 파업투쟁이 의약분업으로 시작됐지만 의료보험 실시이후 누적된 불만이 분출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저수가,저급여,저부담"으로 대표되는 의료보험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료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부담(의료보험료)를 높여 각종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수가)을 올려야만 수입(급여)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낮은 수가를 유지해 의료계가 약가마진을 챙기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성행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진료횟수를 늘리거나 약을 과다투여하는 "박리다매식 의료서비스"도 초래했다.
환자들은 의료보험료를 내면서도 호주머니에서 따로 비싼 진료비를 내야할 처지여서 병원가기가 겁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보험료를 1백%이상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료대란으로 "멍든" 국민들이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의보료 인상을 선뜻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정부는 지난 77년 의료보험을 5백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이때 정부는 수가를 원가의 50~55% 선에 맞췄다.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경우 도저히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를 수선하는 카센터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병.의원보다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23년동안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취약한 의료보험 재정을 이유로 들며 의료계의 주장을 물리쳤다.
의료보험이 시작된 77년을 1백으로 볼때 지난 98년말 현재 수가는 514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507수준이므로 낮은 수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 만큼만 의보수가를 올려온 셈이다.
<>국민들의 피해=낮은 수가는 의료계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약가마진을 챙기고 의료보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진료행위,과잉진료,유령환자 만들기 등을 편법을 쓰도록 만들었다.
또 특진료,비싼 입원실료와 밥값 등의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약가마진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병.의원에서 1개의 약을 사면서 심할 경우 10개까지 공짜로 같은 약을 받았다.
병.의원은 1개 값으로 받은 11개의 약을 투약하면서 의료보험공단에는 11개의 약값을 신청해왔다.
제약회사는 이런 종류의 덤핑을 하기위해 처음부터 약값을 높게 책정했다.
결국 국민은 턱없이 비싼 약을 사먹은 꼴이 됐다.
낮은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만들었다.
의사들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할 처지여서 충분히 상담을 해주지 못했다.
"3시간 대기,3분 진료"가 일상화돼 자연히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만도 높아졌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초음파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많아 의료보험료를 낸 환자들이 별도로 내야하는 진료비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총 진료비의 48%만을 의료보험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52%는 직접 부담하고 있다.
중병에 걸릴 경우 가정경제에 파탄이 일어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해결책=의료보험을 정상화시키려면 의보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보험 적용대상 진료행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의료계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현재의 2백6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중환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충실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때 조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3일 당정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이점을 인정했다.
의료보험료가 낮은 "저부담"체계를 의약분업을 계기로 고쳐 의료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가겠다는 것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