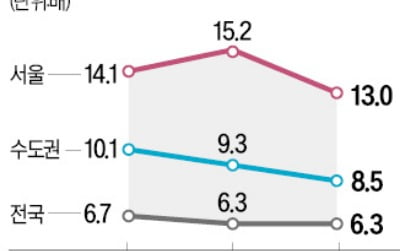[틈새로 본 부동산] 현대-롯데 "설악 재건축 양보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설악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시공권을 둘러싼 두 회사간 갈등은 지난달 11일 조합이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변경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이미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이에 반발하면서 서울지법에 시공사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대 관계자는 "건축심의까지 마치고 사업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롯데가 시공권을 가져가려 하는 것은 재건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시공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그동안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현대측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조합의 시공사 변경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8월중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9월부터 이주와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설악아파트 재건축은 4개동(3~6동) 4백56가구를 기존 가구수로 평수만 늘려 다시 짓는 별로 "먹을 게"없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두 회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롯데건설로서는 설악아파트가 지난 78년 신격호 롯데 회장이 건설업에 뛰어 들면서 처음 지은 아파트란 의미가 있다.
롯데건설의 "고향"인 셈이다.
롯데건설 본사도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4층 자리잡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롯데로선 설악아파트 재건축을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대건설도 건설업계 1위 기업의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권을 수주했다가 어물쩡 물러서면 다른 지역 재건축 수주경쟁에서 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싸움을 벌이면서도 두 회사는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구두선"에 그칠뿐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사업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누구도 없는 것 같다.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결국 오는 14일 서울지법에서 가려지게 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시공권을 둘러싼 두 회사간 갈등은 지난달 11일 조합이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변경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이미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이에 반발하면서 서울지법에 시공사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대 관계자는 "건축심의까지 마치고 사업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롯데가 시공권을 가져가려 하는 것은 재건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시공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그동안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현대측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조합의 시공사 변경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8월중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9월부터 이주와 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설악아파트 재건축은 4개동(3~6동) 4백56가구를 기존 가구수로 평수만 늘려 다시 짓는 별로 "먹을 게"없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두 회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롯데건설로서는 설악아파트가 지난 78년 신격호 롯데 회장이 건설업에 뛰어 들면서 처음 지은 아파트란 의미가 있다.
롯데건설의 "고향"인 셈이다.
롯데건설 본사도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4층 자리잡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롯데로선 설악아파트 재건축을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대건설도 건설업계 1위 기업의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권을 수주했다가 어물쩡 물러서면 다른 지역 재건축 수주경쟁에서 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싸움을 벌이면서도 두 회사는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구두선"에 그칠뿐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사업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누구도 없는 것 같다.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결국 오는 14일 서울지법에서 가려지게 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