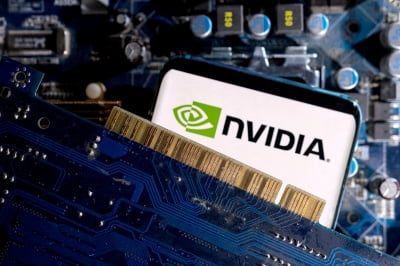[뉴스 따라잡기] '은행 대형화 어디로'..흔들리는 슈퍼은행의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슈퍼 뱅크" 탄생은 물 건너가는 것인가.
정부가 추진해온 초대형 선도은행 육성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들이 저마다 "홀로서기"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도 은행들이 9월말 제출할 경영정상화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립을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슈퍼 뱅크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슈퍼뱅크의 꿈=정부는 지난 98년부터 3~4개의 초대형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권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왔다.
세계 1백대 규모 수준의 대형은행을 키워보자는 의지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도은행의 출현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정부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은행권의 메가머저(mega-merger)열풍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첨단 금융기법과 사이버뱅킹으로 무장한 해외 대형은행들의 공세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형 선도은행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와 먼 현실=그러나 정부의 이런 구상은 당사자인 은행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부터가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교보생명 등 비은행 금융회사와의 자본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빛 등 다른 은행과의 지주회사 체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한빛은행도 후순위채나 영구채권 발행으로 나름대로의 앞길을 찾고 있다.
외환은행은 역시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코메르츠 은행을 증자에 참여시켜 독자생존한다는 전략이다.
우량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이 은행,저 은행으로부터 합병제의를 받고 있지만 아랑곳없이 시종일관 독자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IT(정보기술)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하나,한미은행은 설사 합친다해도 자산규모가 80조원대에 그쳐 정부가 생각하는 슈퍼뱅크에는 한참 못미친다.
이같은 상황에 불편해진 쪽은 국민,주택은행이다.
이 두 은행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정작 합병파트너로 삼을만한 신한,하나,한미은행으로부터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과 주택이 합칠 경우 두 은행 모두 소매금융에 특화된 은행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형은행이 바람직한가=최근에는 국내 은행들의 대형화 구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실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덩치부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실채권 처리 등을 통해 클린뱅크(clean bank)를 지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이 자발적 합병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은 기본이지만 부실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비전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규모를 고려할 때 어차피 세계 10대은행 안에 들지는 못할 것이므로 1백대니 2백대니하는 규모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탄탄한 은행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추구하기에 앞서 튼튼하고 강력한 은행,체질이 건전한 금융기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윌리엄 맥도너 뉴욕FRB총재)는 외국인들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글로벌 플레이어의 육성인지,국내시장 수호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정부가 추진해온 초대형 선도은행 육성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들이 저마다 "홀로서기"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도 은행들이 9월말 제출할 경영정상화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립을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슈퍼 뱅크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슈퍼뱅크의 꿈=정부는 지난 98년부터 3~4개의 초대형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권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왔다.
세계 1백대 규모 수준의 대형은행을 키워보자는 의지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도은행의 출현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정부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은행권의 메가머저(mega-merger)열풍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첨단 금융기법과 사이버뱅킹으로 무장한 해외 대형은행들의 공세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형 선도은행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와 먼 현실=그러나 정부의 이런 구상은 당사자인 은행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부터가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교보생명 등 비은행 금융회사와의 자본제휴를 통해 독자적인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빛 등 다른 은행과의 지주회사 체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한빛은행도 후순위채나 영구채권 발행으로 나름대로의 앞길을 찾고 있다.
외환은행은 역시 지분 31.5%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코메르츠 은행을 증자에 참여시켜 독자생존한다는 전략이다.
우량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이 은행,저 은행으로부터 합병제의를 받고 있지만 아랑곳없이 시종일관 독자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IT(정보기술)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하나,한미은행은 설사 합친다해도 자산규모가 80조원대에 그쳐 정부가 생각하는 슈퍼뱅크에는 한참 못미친다.
이같은 상황에 불편해진 쪽은 국민,주택은행이다.
이 두 은행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정작 합병파트너로 삼을만한 신한,하나,한미은행으로부터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과 주택이 합칠 경우 두 은행 모두 소매금융에 특화된 은행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형은행이 바람직한가=최근에는 국내 은행들의 대형화 구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실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덩치부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실채권 처리 등을 통해 클린뱅크(clean bank)를 지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이 자발적 합병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은 기본이지만 부실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비전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규모를 고려할 때 어차피 세계 10대은행 안에 들지는 못할 것이므로 1백대니 2백대니하는 규모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탄탄한 은행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추구하기에 앞서 튼튼하고 강력한 은행,체질이 건전한 금융기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윌리엄 맥도너 뉴욕FRB총재)는 외국인들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글로벌 플레이어의 육성인지,국내시장 수호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